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는 트위터에 “이번 사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법한 재앙”이라며 “많은 기업이 도태되고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회사들의 매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혼란을 딛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의미다.
위기 후 생존자가 지배한 산업史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차단벽’을 쌓고 있다. 항공·여행·해운·물류 등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궤멸 직전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가 한창인데 ‘코로나 이후’를 말하고 있으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상 이런 예측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14세기 페스트 창궐 이후의 세계사 궤적은 코로나 이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서’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인구 부족으로 야기된 임금 상승의 과실을 수확했다. 숙련공 부족이 가져온 공산품 가격 상승은 자본가들의 부(富)를 키웠다. 이들은 르네상스의 주역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포함한 혁신기업들이 만개한 것도 살펴볼 만하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전통 제조업의 강자들이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쪼그라들거나 사라졌다. 반면 살아남은 혁신 기업들은 위기 후 시장 재편 과정에서 신기술과 새 비즈니스모델을 앞세워 치고나갔다. 2007년 총 83억7800만달러(약 10조2800억원)였던 FAANG의 순이익은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215억3900만달러(약 149조2400억원)로 2007년보다 14.5배 불어났다.
살려야 할 기업 짓밟는 정치·행정
이런 흐름이 재현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독식(獨食)의 시대’에 주역이 될 만한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의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전 세계가 멈춰선 마당에 기업이 알아서 위기 극복의 과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살려야 할 ‘묘목’을 소중하게 다루기는커녕 짓밟는 행태를 보여 절망스럽다.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모빌리티 혁신을 지연시키고, ‘인터넷은행법’을 부결시켜 케이뱅크를 고사 직전으로 몬 것은 4·15 총선 승리만 염두에 둔 ‘표 계산’의 결과다. 산업·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여행·면세점 업계 등의 ‘골든타임’은 허투루 지나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한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에 크게 뒤처졌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간극을 좁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scream@hankyung.com


![[다산칼럼] 의료시장의 힘 일깨워 준 '코로나 방역'](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7.21017127.3.jpg)
![[취재수첩] '위장전입' 꾸짖더니…미래통합당 닮아가는 與](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7.17587843.3.jpg)
![[뉴스의 맥] '팬데믹 공포'에 外人 자금 '썰물'…외환보유액 방어막 점검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7.1926309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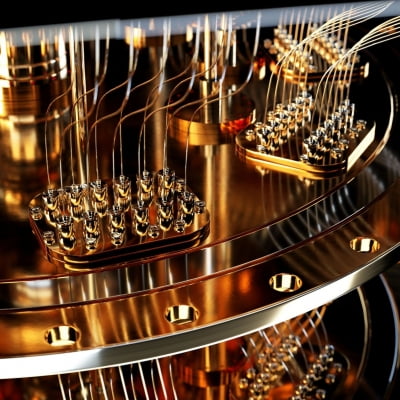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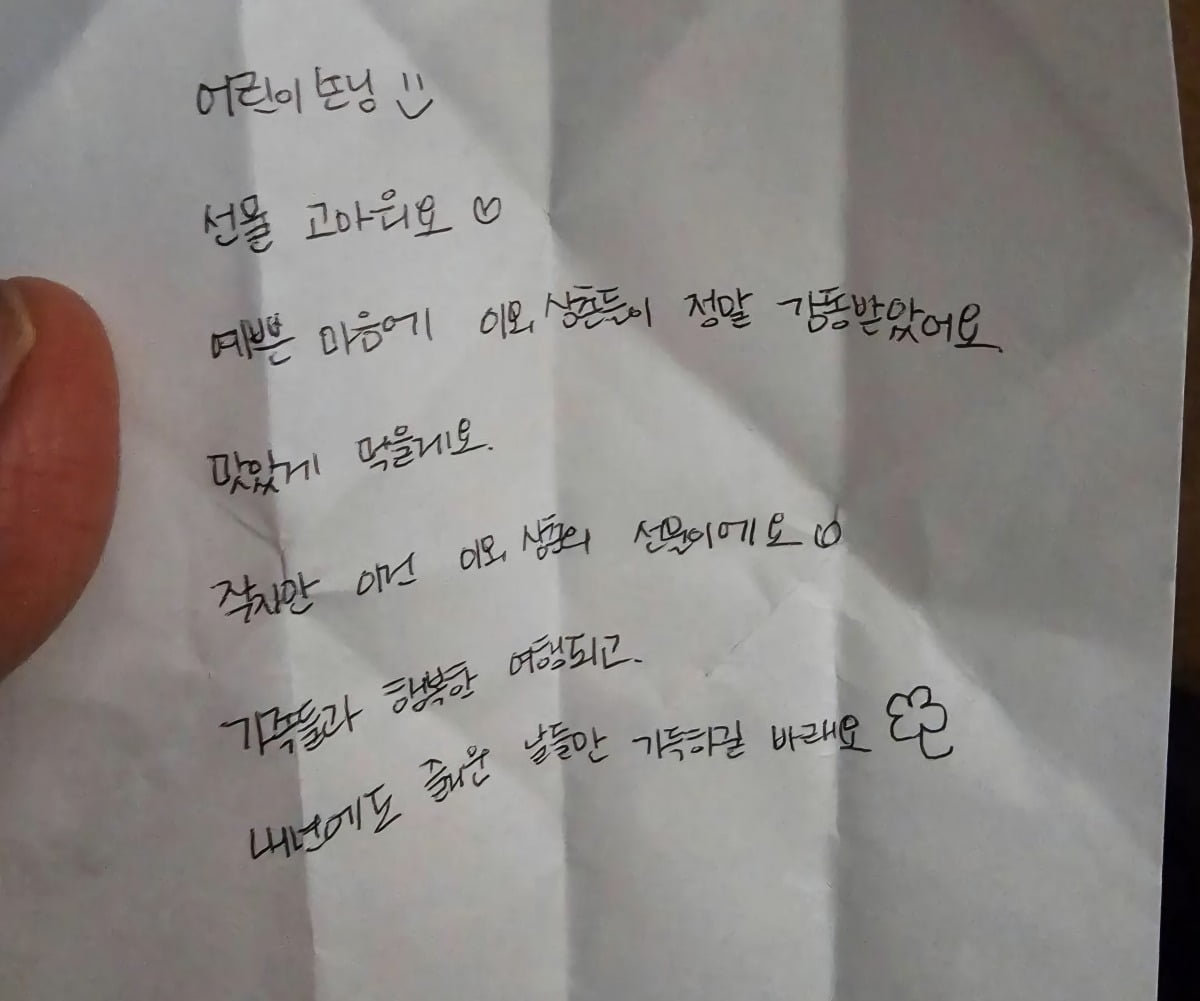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