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의 경제산책] 코로나에 가려진 '경제 복병' 국제유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우디·러시아 '치킨게임'에 WTI 폭락
코로나 때문에 저유가 충격 덜 부각돼
美셰일기업 부실화하면 장기침체 가능성
코로나 때문에 저유가 충격 덜 부각돼
美셰일기업 부실화하면 장기침체 가능성
SK증권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지수가 최저 1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올해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스피는 당일 1700 밑으로 내려갔지요. 증권사 전망치가 단 몇 시간만에 어긋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 만큼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2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는데, 그 이튿날 2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각국 주가와 국제유가의 자유 낙하(free fall)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WTI가 어젯밤 배럴당 20.37달러까지 떨어진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치 기록이지요.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25달러에 불과합니다. 국제유가는 2014년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고, 지난달만 해도 WTI 기준으로 50달러를 넘었지요.
국제유가 급락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간 증산 경쟁에다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요 감소가 현실화하면 2009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 1분기에만 2.5% 위축됐는데, 하루 250만 배럴의 구매 수요가 줄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석유 전쟁에 불을 당긴 건 이달 6일 발생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러시아가 “5~6월 중 다시 만날 수 있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중동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 직후 자체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춘 데 이어 다음달부터 큰 폭 증산하겠다고 공언했지요. 생산능력도 하루 1300만 배럴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UAE) 및 쿠웨이트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주요 산유국이 추가 증산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극한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까요. 표면적인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정면 대결이지만, 미국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막대한 석유를 해외에서 조달해온 미국은 수 년 전부터 ‘석유 순수출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셰일오일을 대량 채취할 수 있게 된 게 배경입니다. 2010년만 해도 하루 54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던 미국은 작년 128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훌쩍 뛰어넘는 세계 1위 생산국이 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있게 ‘에너지 패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본격 증산에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업계는 곧바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경우 땅 속에서 원유를 뽑아내면 되지만,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은 퇴적암(셰일) 층에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 석유를 뽑아내는 공법을 써야 해 생산 비용이 훨씬 높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최저 10달러, 러시아는 17달러, 미국(셰일오일)은 3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역학 관계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유가에 대한 대응 여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수출의 7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요.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이 “배럴당 25~30달러 수준의 유가를 향후 6~10년 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재정균형 원가를 보면 러시아가 배럴당 40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80달러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저유가 상황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유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폭락을 주도했던 것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었죠. 셰일 관련 기업들이 조만간 연쇄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미국 고위험·고수익(하이일드) 채권 시장의 약 11%를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화약고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대거 부실화하면서 미국 신용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CLO는 각 기업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데, 셰일오일 등 기업 채권을 기반으로 많이 발행돼 있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일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양적완화 계획을 내놓고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데는 미국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미국 셰일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부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2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는데, 그 이튿날 2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각국 주가와 국제유가의 자유 낙하(free fall)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WTI가 어젯밤 배럴당 20.37달러까지 떨어진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치 기록이지요.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25달러에 불과합니다. 국제유가는 2014년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고, 지난달만 해도 WTI 기준으로 50달러를 넘었지요.
국제유가 급락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간 증산 경쟁에다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요 감소가 현실화하면 2009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 1분기에만 2.5% 위축됐는데, 하루 250만 배럴의 구매 수요가 줄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석유 전쟁에 불을 당긴 건 이달 6일 발생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러시아가 “5~6월 중 다시 만날 수 있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중동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 직후 자체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춘 데 이어 다음달부터 큰 폭 증산하겠다고 공언했지요. 생산능력도 하루 1300만 배럴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UAE) 및 쿠웨이트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주요 산유국이 추가 증산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극한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까요. 표면적인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정면 대결이지만, 미국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막대한 석유를 해외에서 조달해온 미국은 수 년 전부터 ‘석유 순수출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셰일오일을 대량 채취할 수 있게 된 게 배경입니다. 2010년만 해도 하루 54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던 미국은 작년 128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훌쩍 뛰어넘는 세계 1위 생산국이 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있게 ‘에너지 패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본격 증산에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업계는 곧바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경우 땅 속에서 원유를 뽑아내면 되지만,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은 퇴적암(셰일) 층에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 석유를 뽑아내는 공법을 써야 해 생산 비용이 훨씬 높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최저 10달러, 러시아는 17달러, 미국(셰일오일)은 3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역학 관계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유가에 대한 대응 여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수출의 7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요.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이 “배럴당 25~30달러 수준의 유가를 향후 6~10년 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재정균형 원가를 보면 러시아가 배럴당 40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80달러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저유가 상황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유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폭락을 주도했던 것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었죠. 셰일 관련 기업들이 조만간 연쇄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미국 고위험·고수익(하이일드) 채권 시장의 약 11%를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화약고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대거 부실화하면서 미국 신용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CLO는 각 기업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데, 셰일오일 등 기업 채권을 기반으로 많이 발행돼 있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일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양적완화 계획을 내놓고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데는 미국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미국 셰일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부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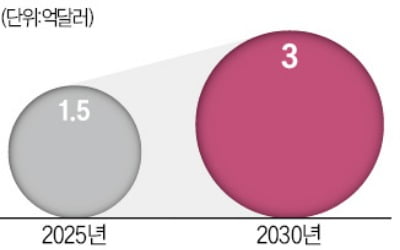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