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심리적 불안과 맞물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강박적인 사고가 반복되면 스스로 덫에 걸리기 쉽다. 스포츠 경기가 대표적이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팀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공한증(恐韓症)도 그런 사례다.
최근 중국인들은 60년 주기의 ‘경자년(庚子年) 징크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840년 청(淸) 왕조의 몰락을 불러온 아편전쟁이 시작됐고, 1900년에는 외세 배척을 내세운 의화단 운동의 여파로 열강 군대가 베이징에 진격했다. 1960년에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실패에 따른 대기근으로 36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그로부터 60년 만인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의 진원지로 전 세계의 원성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미국과의 경제 전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외자 이탈에 이어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될까봐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끝자리 연도가 ‘9’인 ‘아홉수 징크스’에 시달렸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중국 담당 편집자 제임스 마일스는 ‘9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5·4운동 100주년, 개혁개방·미중 수교 40주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30주년, 티베트 봉기 60주년 등 ‘위험한 기념일’을 열거했다.
‘9’는 1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 이전의 불완전한 상태, 대격변의 직전을 상징한다. 한편에서는 ‘가장 큰 수’로 여긴다. 실생활에서도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10만원짜리를 9만9000원에 거래할 때의 체감효과는 양쪽 모두 좋아진다.
징크스도 깨질 수 있다. 질 것으로 여겼던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체념했던 일을 잘 해내면 심적 부담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내년에 한국 나이로 69세가 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아홉수’에 이어 올해 ‘경자년 징크스’까지 겹친 ‘불안 고개’를 어떻게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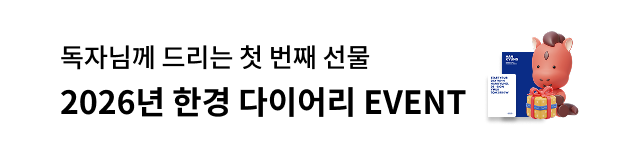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천자 칼럼] 아무도 모르는 북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479855.3.jpg)
![[천자 칼럼] 한일합섬의 추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469360.3.jpg)
![[천자 칼럼] 무관객 음악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46109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