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경쟁 '춘추전국'
'IBM·구글 '초전도큐비트' 개발
삼성전자 '이온트랩' 방식에 투자
인텔은 '반도체 양자점' 연구 중
MS, 유일하게 '위상수학'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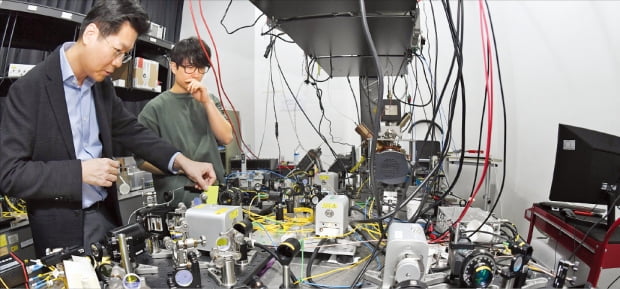

IBM 구글 등이 채택한 초전도 큐비트 방식은 1999년 일본 NEC 연구진이 처음 구현했다. 극저온 속에서 초전도체와 양자컴용 트랜지스터인 조셉슨 소자를 이용해 큐비트를 제어한다. 가장 범용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노하우가 많이 쌓여 양자컴을 구현하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온트랩 방식은 이터븀, 스트론튬 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낸 ‘이온’을 이용해 큐비트를 만든다. 레이저를 쏴 ‘이온의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 에너지 차를 이용한 덫(트랩)을 생성해 이온을 가두고 제어한다. 상온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초전도 큐비트 방식보다 계산 결과가 더 정확하다. 다른 큐비트에 비해 ‘결맞음’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온트랩 방식 양자컴 개발업체 아이온큐에 650억원을 투자한 이유다. 하지만 이온트랩은 초전도 큐비트보다 만들기가 더 어렵다.
인텔이 상용화를 노리고 있는 반도체 양자점 방식은 전자의 위 또는 아래 방향 회전(스핀)을 이용해 큐비트를 만든다. 이온트랩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레이저가 아니라 전압으로 전자를 가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상수학을 이용한 양자컴은 이론상 가장 완벽한 ‘궁극의 양자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험적으로도 구현된 사례가 없다. MS가 유일하게 도전하고 있다.
진격의 양자컴 생태계
글로벌 IT 기업들의 양자컴 개발 경쟁에 따라 각국에선 양자컴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독일 보쉬는 카셰어링, 물류 등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미국 자파타컴퓨팅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3사도 내비게이션 최적화 등을 위해 양자컴 투자를 늘리고 있다. 통행량, 신호체계, 통행 속도, 날씨, 사고 등 빅데이터 분석에 양자컴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원큐빗, 케임브리지퀀텀컴퓨팅, QC웨어, OTI루미오닉스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BM 등에 따르면 ‘세상에 없던’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1000큐비트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양자컴이 필요하다. 큐비트 간 에러가 없는 ‘유효 큐비트’ 기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비춰보면 렘데시비르 등 기존 치료제의 용도를 바꾸는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아예 코로나19 맞춤형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이 지난해 밝힌 53큐비트 양자컴 ‘시커모어’의 유효 큐비트는 절반(20여 개)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큐비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에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유효 큐비트 1000개’ 양자컴이 언제 등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를 실제로 구현할 칩(하드웨어)과 SW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