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임상시험서 환자 인종 중요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서 위암은 가장 흔한 암이지만 미국에서는 희귀암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인종별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달리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인종별 유전적 특성은 항암제 임상 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재단(GRF), 클리노믹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하버드대 등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1094명의 전장 유전체와 건강검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인 1000명 게놈(Korea1K)'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8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3년 미국과 영국에서 확립된 표준유전체지도와 한국인 1000명의 유전체를 비교했더니 3902만5362개의 유전자가 달랐다. 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만 발견되는 유전자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인에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는 데 Korea1K가 표준유전체지도보다 뛰어났다는 것이다. 기존 한국인 위암 환자의 암 유전체 데이터를 Korea1K, 다른 인종의 변이 유전체 데이터와 비교해 암세포와 연관된 체세포 변이를 찾았더니 Korea1K를 이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인종적 구성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시험계획(IND)을 심사할 때 여러 인종이 섞인 임상시험 데이터를 선호한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임상 1상부터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호주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피험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FDA도 호주 임상 데이터를 더 좋게 본다"고 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이라도 데이터가 좋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국내에서 뇌종양 임상 1상을 마치고 호주에서 임상 2상에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미국에서 다음 임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술이전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인을 포함한 다인종 피험자들이 참여하는 임상 2상을 선호한다"며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한다고 했더니 글로벌 제약사의 사업개발(BD)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재단(GRF), 클리노믹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하버드대 등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1094명의 전장 유전체와 건강검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인 1000명 게놈(Korea1K)'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8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3년 미국과 영국에서 확립된 표준유전체지도와 한국인 1000명의 유전체를 비교했더니 3902만5362개의 유전자가 달랐다. 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만 발견되는 유전자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인에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는 데 Korea1K가 표준유전체지도보다 뛰어났다는 것이다. 기존 한국인 위암 환자의 암 유전체 데이터를 Korea1K, 다른 인종의 변이 유전체 데이터와 비교해 암세포와 연관된 체세포 변이를 찾았더니 Korea1K를 이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인종적 구성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시험계획(IND)을 심사할 때 여러 인종이 섞인 임상시험 데이터를 선호한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임상 1상부터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호주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피험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FDA도 호주 임상 데이터를 더 좋게 본다"고 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이라도 데이터가 좋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국내에서 뇌종양 임상 1상을 마치고 호주에서 임상 2상에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미국에서 다음 임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술이전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인을 포함한 다인종 피험자들이 참여하는 임상 2상을 선호한다"며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한다고 했더니 글로벌 제약사의 사업개발(BD)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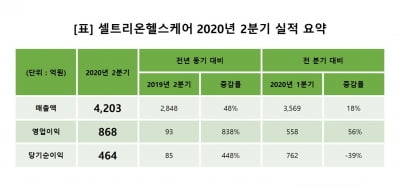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