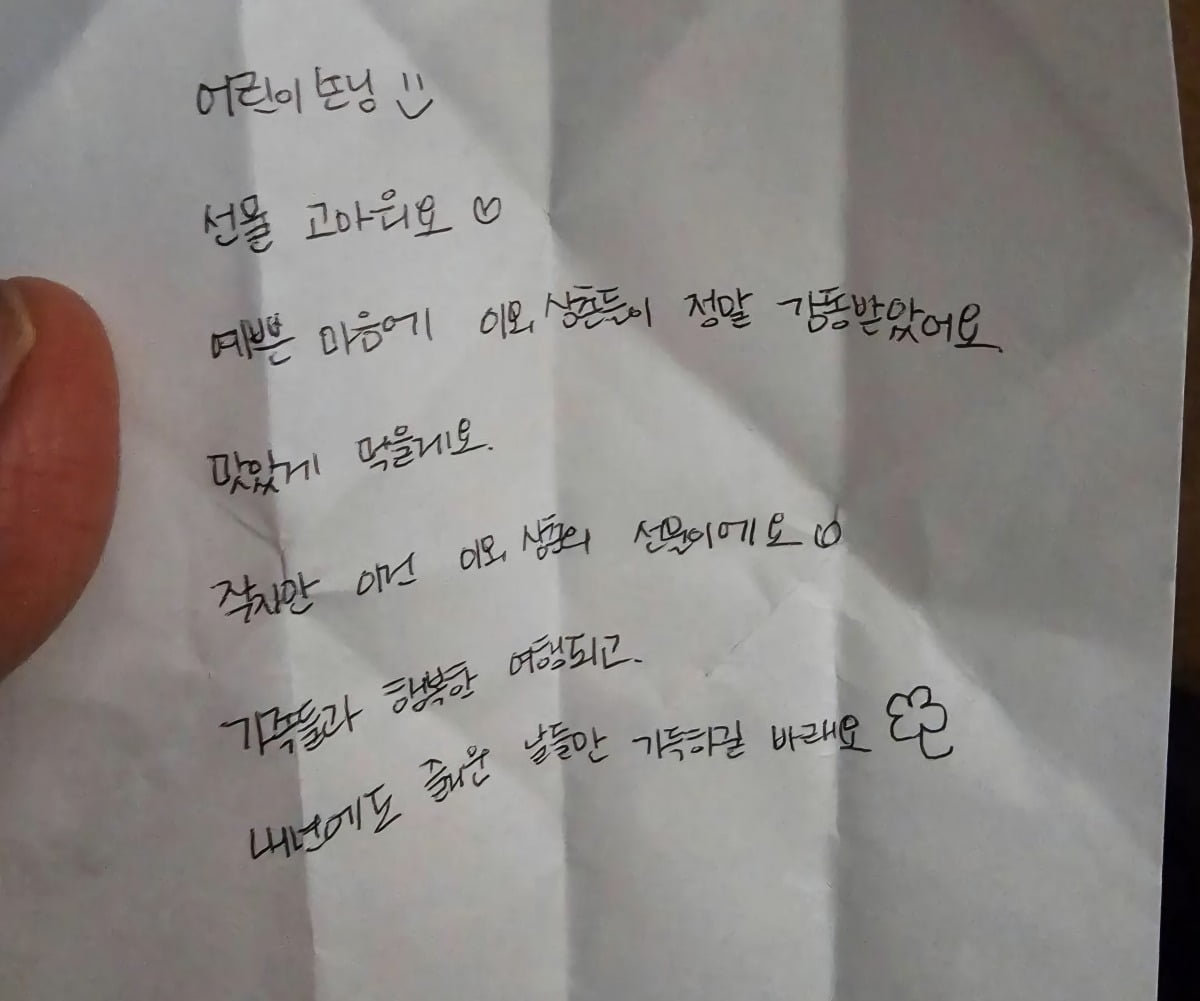봄마다 흩날리던 그 송홧가루가 화폭에 가득하다. 그야말로 ‘송화 분분’이다. 화면 아래에는 벌거벗은 소년이 꽃을 보며 기어간다. 한 점의 꾸밈도 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일까. 작가에게는 열두 살이 기억의 큰 변곡점이다. 열두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다고 한다.
그 빈자리를 교회에서 채웠고, 자연에서 채웠다. 어수룩하고 친근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린 ‘바보예수’ ‘황색예수’는 그런 기억의 반영이다. 어린 시절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흙과 자연과 호흡했던 기억들, 솔숲에 누워 잠들었던 추억들은 ‘생명의 노래’ 시리즈에 담겼다. ‘송화분분 12세의 자화상’은 이 시리즈의 연장이다. 김 교수는 제1회 화이트원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는 23일부터 서울 청담동 갤러리 화이트원에서 열리는 수상 기념전에서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서화동 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그림이 있는 아침] 이중섭 '투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774531.3.jpg)
![[그림이 있는 아침] 오지호 '남향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A.22706539.3.jpg)
![[그림이 있는 아침] 백영수 '장에 가는 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A.2264489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