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온갖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정부로서도 난감한 일일 것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0주 연속 상승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돼 청약시장에도 광풍이 분다. 올 들어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99 대1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코로나 사태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것은 무엇보다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려 있는 탓이다. 유동성이 폭증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정부가 집값 상승을 투기수요 탓으로 규정하고, 시종 수요억제에만 치중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부족을 더 심화시켰다. 세제·금융·매매 관련 규제란 규제를 총동원할 줄만 알았지, 가장 기초적인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걸맞은 정책을 제대로 편 적이 없다.
지난 3년의 부동산대책 실상이 이런데도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식의 결기만 보여온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비치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장관, 청와대 고위급들이 부동산 안정을 장담하며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고 했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했던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단견 중의 단견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넓고 좋은 집, 더 좋은 입지 등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도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응답자가 84%로 역대 최고치였다. 자가(自家)보유율은 아직 61%대다. 이런 사회·심리지표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는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시장친화적인 주택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기본소득 검토 않는다"는 洪부총리, 이번엔 믿어도 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2.22140988.3.jpg)
![[사설] 끝내 밀어붙인 거대 여당…'브레이크 없는 독주' 서막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A.2291998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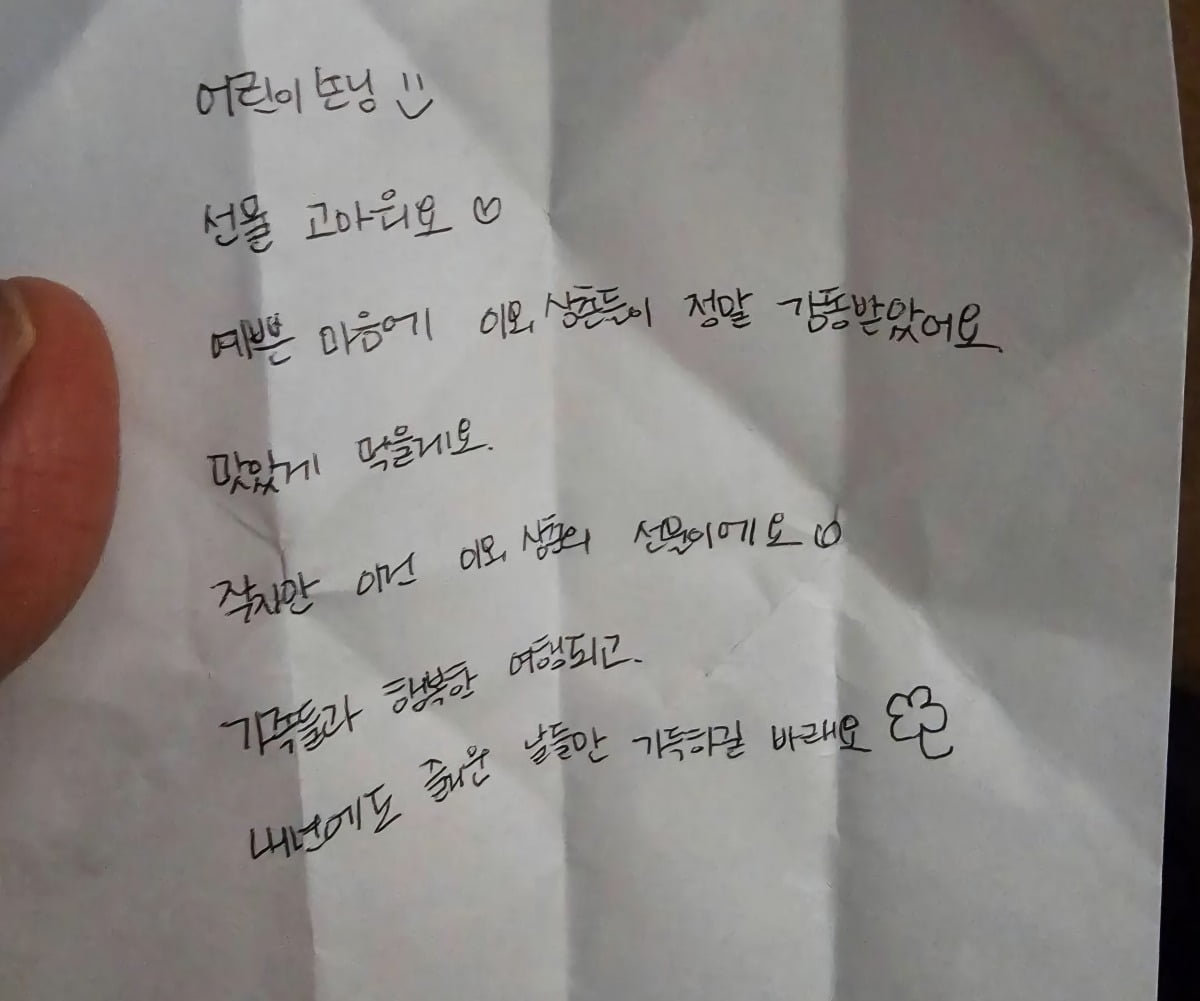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