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치 사진·글 / 서울셀렉션
320쪽│2만원
고백하는 사람들
김재웅 지음 / 푸른역사
472쪽│2만5000원

《1950》은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였던 존 리치 전 NBC 기자가 남긴 컬러 사진집이다. 당시 최고급 컬러 사진 필름이었던 ‘코다크롬’으로 찍은 사진들이다. 그동안 흑백 이미지로만 인식돼온 6·25전쟁을 생생한 총천연색으로 살려낸다.
책 속 사진들은 상자 안에 담긴 채 저자의 고향인 미국 메인주의 케이프 엘리자베스에 보관돼 있다가 5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공개됐다. 전쟁 기간에 저자가 촬영한 900장의 사진 중 150여 장을 선별해 책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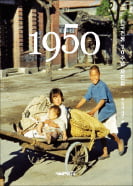
저자는 “내 바람은 이 사진을 보는 독자들이 한국전쟁을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이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 그리고 강인한 소생의 의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전쟁의 한복판이나 피란길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강인한 미소에서 오히려 전쟁의 아픔이 더욱 크게 배어나온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은 김일성종합대 교수와 중학교 교사, 배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참심원, 인민군 하사관과 병사들, 조선중앙통신사 직원 등 매우 다양하다.
의외의 기록들이 속속 나온다. 1947년 김일성종합대에 임용될 예정이던 학자 중 44.4%가 남한 출신이었다. 일제 잔재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북한의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일제에 협력한 공직자 출신 또는 전문가들은 악질적 친일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기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빨갱이님’이라고 불렀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나온다.
저자는 “‘지배층의 언어’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 자신의 일상 언어로 기록된 자서전·이력서는 스냅 사진처럼 해방 직후 북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이미아의 독서공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위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952058.3.jpg)
![[책꽂이] 바이오 인더스트리 밸류에이션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953762.3.jpg)
![[책마을] 현실 딛고 나아가는 여성 3代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95158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