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용돈"…'민식이법 놀이' 공포 확산 [영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식이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진통 여전
운전자에겐 공포…"어린이 교통교육 시급"
운전자에겐 공포…"어린이 교통교육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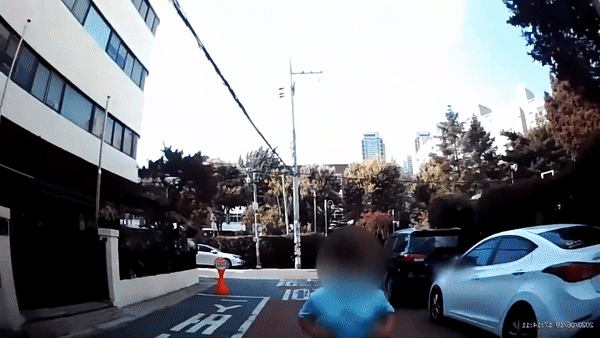
지난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글쓴이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놀이’라고 해서 차를 따라가 만지면 돈을 준다더라”며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한 번 만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요즘 SNS에선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는 운전자들의 토로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상황을 설명한 글은 기본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한 차량을 쫓아오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동영상도 여럿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선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학교 앞’을 검색하면 △민식이법 놀이 △스쿨존 놀이 △자동차 따라가기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등이 연관 또는 추천검색어로 뒤따른다.
○운전자 부담 커져…“교통교육 시급”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용돈"…'민식이법 놀이' 공포 확산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126236.1.jpg)
통상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이었는지, 사고 또는 교통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나(예견 가능성) 등을 놓고 안전운전 위반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지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어린이 교통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7)는 “운전자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어린이를 상대로 차량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스쿨존은 2018년 기준 1만6765곳으로 10년 전인 2008년 8999곳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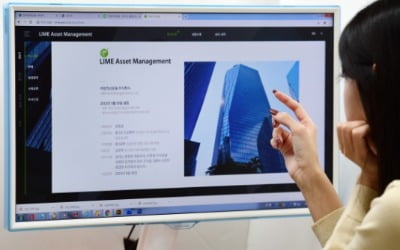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