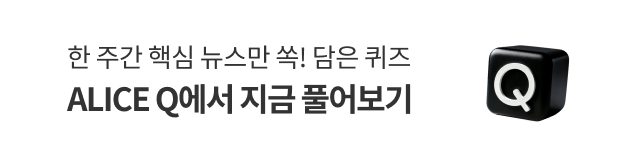코로나 재확산…실업률 12.6%
일자리 8000만개 사라질 수도
"새 일자리 찾도록 지원책 세워야"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말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9.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일자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당시 OECD 평균 실업률은 최고 8.6%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2022년까지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OECD는 실업 대란 해결책으로 고용보조금의 ‘단계적 축소’를 각국 정부에 주문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미국도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실업률 상승 자체를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좀비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이제는 보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그래야만 노동시장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살아남기 어려워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의 상당 몫을 부담하거나 저리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보편적인 고용보조금 지원책을 단숨에 철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여전히 셧다운 상태에 놓인 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7월 말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실업수당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역효과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