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게 죄?" 맞벌이는 집 사지 말라는 부동산 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빚 내서 서울에 집 못 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2014년 이후 70%였던 서울 LTV 상한선은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40%로 확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상한이 20%까지 줄었다. 예컨대 2014년에는 시가 14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9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로 인해 한국의 LTV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 등에 따르면 미국(80%) 스웨덴(85%) 네덜란드(100%) 홍콩(80~90%) 싱가포르(1주택자 75%, 2주택자 45%) 등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선진국들도 LTV 상한이 70%가 넘는다. 집값 순위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노르웨이 오슬로조차도 LTV 상한이 85%고, 오슬로 내 2주택자는 60%를 적용받는다.
대출이 막힌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택한 마지막 방법은 '전세 끼고 집 구입'이었다. 이마저도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천 봉쇄됐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부(金不)분리 등을 제안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빚 내서 집 구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그림의 떡'
정부가 이를 보완하겠다고 내놓은 공급 대책에서도 고소득 직장인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가의 40%만 내고 최장 30년간 지분을 나눠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대표적이다.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기준을 내걸었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는 3인가구 기준 844만원인데,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의 상당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서울 소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 조모씨(38)는 “840만원을 번다고 해도 아이 교육 등에 돈을 쓰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혔는데 이 돈을 모아서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여전히 가혹하다. 정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기준을 상향했지만 여전히 낮다는 얘기다. 실수요자들은 맞벌이와 외벌이 기준이 고작 10%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조차 8000만원 이하다.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대기업에 다니거나, 둘 다 탄탄한 중견 기업에 다닌다면 꼼짝없이 40%의 LTV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재산 적어도 소득 높으면 죄?”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고소득자 역차별'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0%인 56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38조3078억원)의 94.9%(36조3541억원)를 냈다.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비중이 97.0%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복지제도가 소득 상위 20~30%를 배제하는 ‘선별적 복지’로 설계돼서다.이런 불공평에 익숙한 고소득자들이 '부동산 역차별'에 분노하는 이유는 집을 구입할 때 월 소득 차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지만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아 집을 산 이들이 집이 없는 고소득 직장인보다 자산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원의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씨(33)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지만 열심히 공부해 좋은 조건의 직장에 입사했는데, 이제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으로 자산은 많은데 소득은 낮은 금수저만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적인 소득 기준을 설정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 주택 공급을 늘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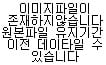

![[영상] 갤노트20 울트라 써보니…스펙 최강이지만 새로움 없는 S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415506.3.gif)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