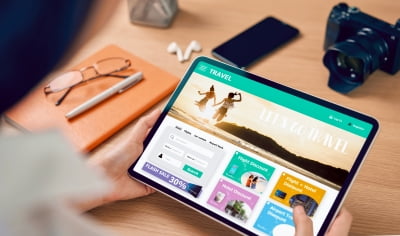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각 지정된 백화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사실상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종속된 근로자로 일했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김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했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의류 및 피혁 제품의 매장 판매 업무에 관해 가장 중요한 매장의 위치와 판매 가액 등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모두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달성해야 할 매출액 및 매출액 점유율 순위 목표를 제시하고, 그 판매 업무를 일별·주별·월별로 수치화·전산화해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판매 업무 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제품의 판매가격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원고들은 제품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피고는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 부담한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하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 부분은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뿐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