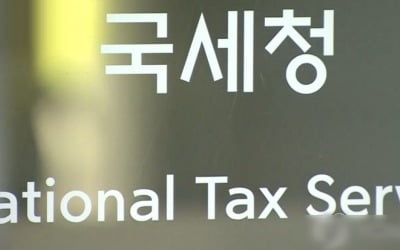언론의 비판기능 무력화…개혁 아닌 퇴행
문혜정 지식사회부 차장

뜬금없이 10여 년 전 일이 떠오른 건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때문이다. 법무부가 검사와 기자가 대면접촉할 경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일종의 대장(臺帳)에 기록·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 직속 기구로 지난 6월 출범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다. 기자와의 만남을 세세히 기록해 놓으면 ‘검찰 개혁’과 ‘인권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까.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검언유착 의혹’에서 알 수 있듯,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관련 취재와 보도는 검찰의 ‘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정치인 등 공직자와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및 첩보는 수사팀(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독 기사’를 경쟁하는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순간,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를 담당하는 기자의 역할은 수사 및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 본류다. 이 과정에서 내부자의 제보와 고발, 다양하고 비판적인 의견 수렴은 기자에게 중요한 요소다.
경찰과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이나 타 부처에서 기자와의 만남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무부의 인식대로 ‘검찰발 기사’(서초동 기사)가 너무 많다고 치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관련 ‘세종시발 기사’가 쏟아지면 해당 부처도 공무원들이 기자를 만날 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다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운동장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초등학교 교장과 무엇이 다른가.
실제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검사들을 초등학생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공보관 제도가 있어 일선 수사검사들은 이미 기자를 잘 만나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만나지 말라는 것은 검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올초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권한 및 정보수집 능력 대폭 축소,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고위급 검사장 수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여야 한다. 그런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 기자들의 발과 귀를 묶어두겠다는 발상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
selenmoon@hankyung.com


![[편집국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통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7.14212992.3.jpg)
![[편집국에서] 복합쇼핑몰도 영업 규제하겠다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7.19432074.3.jpg)
![[편집국에서]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7.1578156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