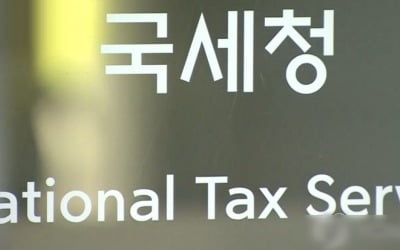해석상 논란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면 이번에 전망치를 내놓은 OECD의 예측력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점이다. 예측력이 떨어지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국민에게는 곱게 비칠 수 없다.

예측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종전에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예측하는 주기를 가능한 한 지켰으나 최근에는 예측치를 수시로 내놓는다. 예측 주기가 금융위기 이후 ‘분기’로 단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월’ 단위로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이 많다. ‘예측’이라기보다 ‘실적치가 나오면 뒤따라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들 기관의 예측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기법상 예측치에서 실적치를 뺀 절대 오차를 백분화한 절대 오차율로 금융위기 이후 예측력을 평가해보면 30%가 넘는 기관이 수두룩하다. 절대 오차율이 30%가 넘으면 그 예측치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각종 예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최근처럼 예측치를 수시로 내놓으면서 그때마다 추세가 바뀌고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면 경제주체들을 안내하는 역할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측력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뉴노멀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종전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추가되면 예측 모형(연립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해진다.
경제행위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코로나19 사태 직후처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여건에서는 예측할 때 필요한 시계열 자료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가변수(dummy)’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변수를 쓰다 보면 그 모형에서 나오는 예측치는 실상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때는 ‘비관론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수록, 경기가 정점을 지날 때는 ‘낙관론의 환상’에 빠져 있을수록 예측력이 더 떨어지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경기 순응성의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관론의 예측과는 반대로 세계 주가는 50% 이상 급등했고 세계 경기도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기관과 개인들도 경기가 과열일 때는 경계하고, 불황일 때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동안정조절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과 사람들이 경기가 과열일 때 더 좋게 보고, 경기가 나쁠 때 더 나쁘게 봐 경기의 진폭이 커진다면 그만큼 경제행위는 어렵게 된다.
예측치 해석도 그렇다. 대부분 통계 조작은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통계의 선택과 해석’상에 통계 조작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사와 같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하거나,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특정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무시하거나 가짜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다. 왜곡되고 조작된 통계와 해석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발생시키고 정책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떨어뜨린다. 복잡한 현실에 ‘가설’을 세워 통계로 입증해 정립되는 경제 이론도 무력화된다. 현 정부 들어 훌륭한 경제학자일수록 나서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