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공공재개발, 추진 쉽지만 해제도 쉽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합설립 없어도 가능…동의율 기준 3/4→2/3
반대 기준은 여전히 1/3…재산권 침해 우려도
반대 기준은 여전히 1/3…재산권 침해 우려도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공공재개발은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개발 방식이다. 서울시와 SH가 압축한 후보지는 49곳이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LH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재개발이 추진위원회설립과 조합설립 단계에서 지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다.
동의율 요건도 확 낮아진다. 조합설립엔 토지등소유자 75%(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66.7% 이상(토지면적 기준은 동일)이 동의하면 공공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나 옛 해제구역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종전 기준보다 10%포인트가량 낮은 동의율 만으로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이라면 조합원 50%의 동의를 얻어 공공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완화된 요건이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토지등소유자 33.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공재개발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이 반대할 경우 해제요건도 동시 충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해온 것도 주민 갈등이 이유였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체 683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394곳을 해제했다. 주민들이 직접 해제를 요청한 곳 가운데 사업이 정체됐다고 판단해 직권해제한 구역도 80곳이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발표 당시 해제구역을 대상지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혼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된 구역은 주민 반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다시 공공재개발에 포함되면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해제구역도 대상지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구조다. 재건축은 처음부터 현금청산 여부가 결정되지만 재개발은 사업 막바지에 가서야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차할 수 있다. 공공이 앞장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상가 등의 비중이 높아 재개발 동의율이 낮은 구역들이 대표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겐 조합원분양가가 아닌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적용한다”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원조합원들이 되팔고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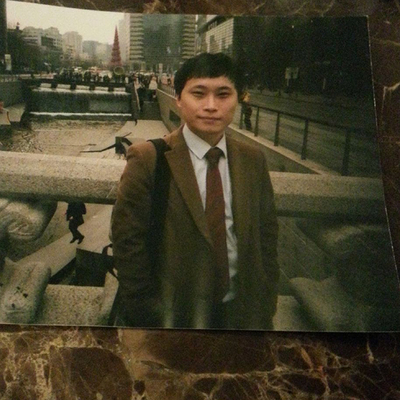

![[집코노미 포커스] "임대주택도 고급화…누구나 살고싶은 기본주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24065.3.jpg)
![계약갱신, 4년 아닌 6년?…모르면 손해보는 임대차 3법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14595.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