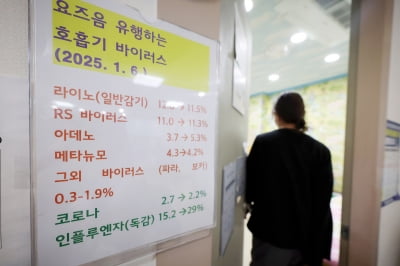현대인들이 빅 브라더 사회, 빅 브라더 정부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빅 브라더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거나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중의 인기를 업은 선동적 독재자가 나타나 갑자기 구축해버릴 수 있는 게 빅 브라더 체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빅 브라더 사회는 하나하나로 보면 그럴듯한, 명분도 있고 취지도 나름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현실에 자리 잡으면서 그것들의 합으로 어느덧 우리 곁에 들어서는 그런 체제라고 봐야 한다.
◆넘치는 규제법, 감시기구…'구성의 오류' 걱정
‘구성의 오류’를 생각하면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똑똑한데, 집단이 되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다. 사물이든, 원리든, 정책이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로 합쳐버리면 괴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구성의 오류다. 미인도를 그린다고 가정할 때 누구의 멋진 입, 다른 누구의 매력적인 코, 또 다른 누구의 빛나는 눈을 최고라고 떼어 와 하나로 만들었는데 결과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정부가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동산 감시기구도 그런 맥락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치솟자,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간판 바꾼다고 감시기구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이라는 게 있어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국세청, 금융위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총 동원돼 있는데 또 하나의 감시기구를 만들겠다니….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적 영역은 정부의 행정 내지는 권력 감시망에 다 들어간다. 여러 번 양보해서 거래분석원이 한시적으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치고, 또 아주 제한적으로 활동한다고 치자.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귀가 때까지 온갖 군데서 CCTV에 내 모습이 다 찍히고, 모든 금융거래는 국세청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관련 특화 기구까지 신설돼 또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쓰는 온갖 신용카드 정보도 민간의 카드회사에 다 쌓여 있다. 이게 정부 당국의 손에 넘어가면 나의 모든 투자와 소비, 기타 경제활동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게 된다. 그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최근에는 통신정보까지 정부에 그대로 넘어간 적이 있다. ‘코로나 대응’에서 0월0일 0시 전후로 1시간 동안 이태원 00거리를 지나친 시민들의 자료가 정부에 넘어간 과정에서, 혹은 0월0일0시 전후로 이른바 ‘광화문 집회’ 일대에 있던 시민들의 개인 위치정보가 정부 당국에 넘어간 과정은 과연 완전히 합법적인가. 말끝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무기명·비식별 정보 활용조차도 막아온 이들은 이런 식별·기명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절차나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나 정당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판사출신이라는 이수진 의원이 도심 집회를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빅 브라더 사회 경계 차원에서 보면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빅 브라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개개인의 말과 행동(CCTV), 은행통장(FIU, 부동산거래분석원), 계약서(부동산거래분석원), 카드지출과 소비활동(카드사 등), 사업(국세청) 등을 정부가 모두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라.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시·감찰 기구는 늘렸다. 모두가 얼핏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존재 이유가 있고, 감시하는 명분도 있고, 고유의 목적만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늘 ‘권력’에 통합 관리될 수 있는 개별 시스템일 뿐이다. 거듭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판단도 제각각, 위기국면이라 한들 '권력 횡포'는 위험
‘코로나 난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다.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돌파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빅 브라더 사회 경계 차원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선 곤란하다.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는 지금이 진짜 ‘위기’인가. 위기에 대한 판단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지금을 위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상시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좀 더 조심하면 될 정도라는 시각을 북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본다. 여기서부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위기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유보될 수 있으며, 천부적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침해가 용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데서 원칙이 없이 권력이 하자는 대로 즉흥적으로 제도가 바뀌면 빅 브라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전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쩌면 전에도 있었던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의 활동을 좀 더 세밀히 보게 됐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고유 권한과 현대 민주 사회의 천부적 권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일까. 가령 출퇴근길 콩나물 지하철과 만원 버스는 매일 그대로인데, 유독 밖에서의 집회나 식당 회식은 왜 금지돼야 하는가. 출퇴근이 생업 때문에 중요하다면 매일매일의 생업은 중요하고, 나의 종교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은 간섭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굳이 가리자면 제한적으로라도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전자 쪽이 아닐까.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다수(정확히는 정부 내지는 권력, 진정 다수인지 목소리만 큰 소수인지, 선동하는 일부 그룹인지 판단도 쉽지 않다)의 일방적 결정이나 횡포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어 합리적 방향을 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공론이라면 공론이다.
◆'공공''공익'에 대한 경계, 깨어있어야 민주 시민
내가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상대방 얼굴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절제원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덜 든다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만들자는 발상도 접어야 한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내 마음대로 마구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그 위치도 바뀔 수 있다. 권력자부터 명심해야겠지만, 그들을 전면에 세운 유권자 그룹도 다를 게 없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할 대목에서는 용인해야 하는 게 민주사회 아닌가.무엇보다 법이 너무 많다. 규제 법, 강제 법, 의무 법, 금지 법이 합쳐진 사회의 모습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ITC(정보기술통신)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만 해도 놀라울 지경이다. 이게 특정그룹에 통제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보라. 그게 정부라 해도, 아니 정부라는 권력이기에 더 무서운 것이다. 정부가 “자제해 달라”는 호소 정도는 용인될 만하지만, 때로는 그만도 무시무시하게 들릴 때가 많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을 앞세우면 무서울 때가 많다. ‘공익’이라는 말도 그럴 듯하지만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결국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빅 브라더 사회는 어느 날 성큼 우리 앞에 오게 된다. 그때가 되면 늦으리... 뉘우치고 후회한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