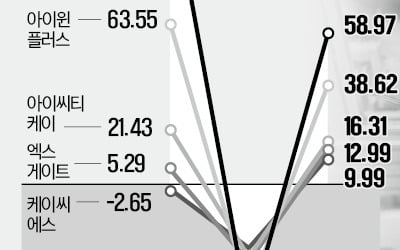160여년간 조선 괴롭힌 왜구
조선의 외교정책 온건·회유로 일관해 실패
대마도 정벌 대원정 불구 근절되지 않아

조선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을 대외정책 기조로 삼았다. 명(明)나라에게 사대(事大)를 취하며, 일본 등 타국과 가깝게 지낸다는 인식이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현실’이라는 명목으로 굴복을 주장하고, 중국적 질서에 충실한 성리학자들 입장에선 최고의 선택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왜구는 고려 말에 비해 규모는 작아졌지만 해를 바꿔가면서 무려 160여 년 동안 조선을 줄기차게 괴롭혔다.
1393년 3월 왜구가 충청도 해안인 보령을 침공해 병선을 탈취했고, 한양의 입구인 강화도의 교동을 공격했다. 다음 해에는 경상도 일대를 시작으로 전라도와 서해안의 곳곳을 침략했다. 이후 매 해 침략했다. 1396년 8월에 120척이 경상도 해안을, 10월 말에는 부산의 동래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신정부는 긴장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조선의 강온 양면책

그런데 1418년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마도주가 죽고, 해적 두목이 실권을 장악한 데다가 기근까지 발생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왜구들은 다시 1419년 5월에 50척의 해적선으로 충청도 비인에 나타났고, 해주의 연평곶을 공격했다. 백성들은 약탈과 살육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온건과 회유로 일관한 조선의 미봉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위기의식이 심각해지고 신정부의 정통성과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대마도 정벌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의 반대가 있었고, 조선 내부적으로도 권력투쟁을 끝낸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지 몇 달 안 된 불안정한 시기였다. 또한 자칫하면 본토의 일본군과 충돌할 수 있고, 명나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상왕인 태종은 결국 대마도 공격을 선택했다.
대마도 정벌 대원정

함대는 출항 직후에 맞바람을 맞아 회군했다가 다시 19일 미명에 출항해 20일 정오 무렵에 선발대가 대마도 해안에 도착했다. 조선군은 129척을 소각했고, 1939채의 집을 불태웠다. 하지만 왜구는 104명을 죽였을 뿐이고, 21명을 포로로 잡은 미미한 전과였다. 왜구들은 대마도의 전략적인 환경과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배들 만과 포구 등에 숨긴 채 산 속에 숨어서 조선군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다. 조선군은 북섬과 남섬이 만나는 잘록한 지점인 선월(船越·배를 육지 위로 끌어서 반대편 바다로 넘기는 지점)에 목책을 설치했다. 해당 지점은 1904년 러일 전쟁을 벌일 당시 일본이 운하를 뚫어, 두 섬으로 만들면서 만관교를 세운 곳이다. 조선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중간 지역인 아소완 근처의 니네(仁位)에 상륙했다. 하지만 급습을 받아 장수들을 비롯한 백 여 명 이상의 군사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소강상태에 이르고, 양측은 타협을 시도했다. 조선의 입장으로는 해양작전이 곤란해지는 음력 7월 이전에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대마도주는 항복 의사를 전달했다.
이종무는 정벌을 성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7월 3일 대마도에서 철군했다. 불과 15일 동안의 작전이었다. 제대로 된 전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리품도 빈약한 대규모 해외원정이었다. 만약 현장 사령관인 이종무가 조선을 겨누는 비수인 대마도를 점령한 후 일본 본토의 혼란을 이용해 영토로 편입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타까운 심정 때문인지, 그가 정치군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망상까지 든다.
결국 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청도 해안을 공격했고, 조선은 재정벌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변화하고, 내부에서 반발이 있자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은 대마도가 원래 경상도 계림(鷄林)에 속한 영토이니 군신(君臣)의 예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마도주는 왜인들이 거제도에 살게 하고,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형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시간을 벌고, 실리를 얻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렇게 해서 ‘부산포(동래)’와 ‘내이포(진해)’ 등이 개설했고, 대마도를 경상도 관찰사의 지휘를 받는 영토로 취급했으며, 도주에게는 ‘도선증명서’를 발급해 무역의 독점권을 주었다. 현재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되찾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주로 이 때의 상황과 몇몇 기록들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후에 세종은 일본국에 통신사를 3번 파견하고, 염포를 설치하는 등 대마도에 유화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왜구는 근절되지 않았고, 때때로 침범을 일삼았다. 임진왜란 때는 선봉장으로 일본 군대의 향도 역할을 하면서 부산포에 상륙했다.(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조선의 해양국방력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태조는 고려 말에 대마도 정벌을 시도했던 박위를 책임자로 삼아 1393년도에는 각 도에서 전함을 건조했다. 각 도에는 함대사령관에 해당하는 수군 절제사를 임명했다. 또 용산에 나가 신형 전함의 진수식을 참관했다. 태종도 전문적인 관청을 만들어 약 428척의 전함을 1408년에는 613척으로 늘렸다. 세종은 중국·일본·유구의 선박들을 연구한 후 장점들을 취해 전선을 개량했다. 1420년에는 한강의 양화도에 행차해 신형 전함의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1432년에 조선의 전함은 무려 829척이었다. 1469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각 도마다 구비한 선박의 숫자를 기록했고, 수군의 숫자를 48,800명으로 규정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8도에 배치된 수군 병력을 4만 9317명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병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장학근,《조선시대 수군》)
세조 때에 오면서 변화가 생겼다. 1457년에는 전국을 ‘진관(鎭管)체제’로 재편해서 중요한 군사 거점에는 큰 진(거진)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작은 진들을 포진시켰다. 요즘 개념으로는 연안해군이며, 함대사령부 중심의 체제이다. 이는 능동적이고 진출적인 성격이 아니라 연안방어군으로 임무가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산포’ ‘내이포’ ‘염포(울산)’ 등 왜관에 거주한 수 천 명의 왜인들은 조선의 정책에 점차 불만을 나타냈다. 1510년에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은 4,000~5,000명이 내이포(진해)를 시작으로 부산포(동래)를 점령했다. 이 ‘삼포 왜란’으로 관군이 습격당하고 796가구가 소실됐다. 해당 난 이후에 왜구들은 다국적 해적집단으로 변모해 조선의 해안과 중국의 전 해안을 유린했다. 그런데 조선은 이 무렵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이 등장했다. 해전능력이 뛰어난 왜구를 해상에서 격퇴하는 대신에 육지로 끌어들여 격퇴한다는 전략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당쟁에 뛰어든 사림(士林)들은 미봉책으로 해양을 포기했고, 이 결과로 조선은 국방력의 약화와 임진왜란이라는 대참사를 겪었다.(윤명철,《한민족 해양활동 이야기 2》)
동아시아 8개 해역의 영토갈등, 미·중 간 해군력 충돌, 일본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 해양강국 중국의 이어도 시비와 ‘서해 내해화 전략’, 북한의 해상도발. 2020년 대한민국의 해양정책과 해군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 >


![세종대왕이 한글에 담은 혁신·상생 정신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3847091.3.jpg)
![한민족 역사의 맥, 단군사상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3970540.3.jpg)
![왜곡된 개천절…하늘을 두려워 않는다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917878.3.jpg)
![[단독] 美서 전력기기 품귀…LS·HD현대일렉 "5년치 일감 쌓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