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뉴스를 비롯해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은 여러 방식으로 죽음을 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정작 내 죽음은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뭘까.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독일작가 초청 대담'에서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롤란트 슐츠(44)는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주제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독일 뮌헨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이용해 실시간 회의 방식으로 한국 독자들과 만났다.
지난해 9월 그의 책 '죽음의 에티켓'(스노우폭스북스)이 국내 번역 출간됐다.
책은 "우리가 모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해왔다"며 죽음을 제대로 알자고 말한다.

이어 "이 책은 죽음이란 주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초청장이자 제안서"라며 "유언장을 생각해보고, 내 죽음이 화장이 될지 매장이 될지 등을 고민하면서 죽음에 접근하는 정신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는 병원과 의사의 손에 넘겨지는 공장식 또는 병원식 죽음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죽음의 세계를 보거나 인지하는 기회가 사라진 게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슐츠는 "일상에서 죽음이란 주제를 자주 만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야 경험하게 된다"며 "직접 눈으로 시신을 보는 게 자신의 부모가 죽는 50~60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호스피스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죽음에 대한 외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책 출간 이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으로 독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가 본인이 죽을 것을 예감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읽었던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지인이 가톨릭 사제인데 병원에서 환자 상담도 한다"며 "여성 환자가 죽기 전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남편과 자신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 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슬프지만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 유명인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은 우리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과연 버려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일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다"며 "나머지 순간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의 사회로 1시간가량 진행된 대담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30대 독자들도 많이 참석해 죽음이라는 주제가 단지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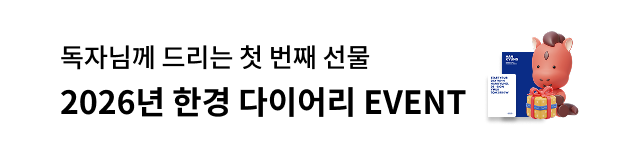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이 아침의 연출가] 새로 쓴 뮤지컬 문법 브로드웨이를 홀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01494.3.jpg)
![연극+콘서트+영화 '터키블루스', 이유 있는 10년 만의 귀환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7010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