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화가' 변시지·'물방울 회화' 김창열…화업으로 道를 구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
극사실주의 '비원파 화가' 활동
50세 낙향 후 작품세계 대전환
황토·먹빛으로 제주 풍경 담아
'폭풍' 등 대표작 40여점 선봬
'김창열-The Path'
7년 만에 갤러리현대 개인전
물방울·문자 만난 30여점 전시
피가로지에 그린 작품부터
'회귀' 연작 변화 추이 보여줘
극사실주의 '비원파 화가' 활동
50세 낙향 후 작품세계 대전환
황토·먹빛으로 제주 풍경 담아
'폭풍' 등 대표작 40여점 선봬
'김창열-The Path'
7년 만에 갤러리현대 개인전
물방울·문자 만난 30여점 전시
피가로지에 그린 작품부터
'회귀' 연작 변화 추이 보여줘

“물방울을 그리는 것은 모든 사물을 투명하고 텅 빈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용해하는 행동이다. (중략)나는 나의 자아를 무화시키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다.”(김창열)
평생을 화업(畵業)에 매진한 대가들의 작업은 수행과도 같다. 끝없는 붓질로 화면을 메우고 색을 쌓는 단색화 작업은 물론 하나의 주제를 화두처럼 들고 평생을 씨름하는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와 소격동 갤러리현대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개인전 ‘변시지, 시대의 빛과 바람’과 ‘김창열-The Path’는 두 대가의 그런 여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50세가 되던 1975년 제주로 귀향한 뒤 작품세계의 대전환을 이뤘다. 서양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서양화와 동양의 문인화 기법을 융합한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다. 그 과정은 지난했다. 작품이 안 되니 술로 배를 채웠고, 바닷가의 자살바위 근처를 배회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는 생전에 “무서운 열병에도 불구하고 나는 캔버스와 맞서 싸웠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완성한 제주 시절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황토색과 먹색으로만 표현한 제주의 자연과 풍광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는 “제주에서는 아열대 태양 빛의 신선한 농도가 극한에 이르면 흰빛도 하얗다 못해 누릿한 황토빛으로 승화된다”고 했다.
황토색 바탕 위에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먹의 선으로 소년, 지팡이를 짚은 노인, 조랑말, 까마귀와 해, 돛단배, 초가, 소나무, 거친 바람과 파도, 수평선 등을 담아냈다. 여기에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작가 자신이다. 그는 일본 소학교 시절 교내 씨름대회에서 다리를 다쳐 장애를 안고 살았다. 거센 바람 속에서 몸을 웅크린 소년과 노인은 절대 고독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궁극의 경지에 닿으려는 작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송정희 공간누보 대표는 “황갈빛의 누런색에서 순도 높은 황금빛 노란색에 이르기까지 그가 제주에서 남겨놓은 1000점이 넘는 작품들은 한 가지 색으로 얼마나 끊임없이 밝음과 어둠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그가 새로운 모색과 출발을 했는지 엿보게 한다”고 했다. 전시는 11월 15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는 문자와 물방울이 만난 초기 작품을 보여준다. 1975년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의 신문지에 수채물감으로 물방울을 그린 ‘피가로 지’가 그 첫 작품이다. 이후 인쇄된 활자를 옮긴 것처럼 캔버스에 한자를 빼곡히 적는 모색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에는 한자의 획을 연상케 하는 추상적 형상이 캔버스에 스민 듯 나타나는 ‘회귀’ 연작을 내놨다. 지하 전시실에는 회귀 연작의 다채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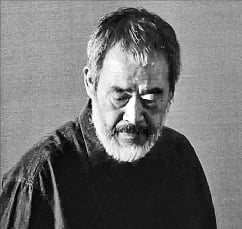
김창열의 작품에서 문자는 인쇄된 듯 단정한 해서체, 서예의 자유로운 운필과 회화적 요소가 강조된 초서체 등 다양하게 등장한다. 문자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물방울과 문자는 대립하기도 하고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문자가 이지러지면서 추상성을 띠기도 한다.
2층 전시장에는 회귀 연작 중 먹과 한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걸려 있다. 캔버스에 한지를 붙이고 글자 연습을 하듯 천자문을 반복적으로 쓴 작품에서는 먹의 선이 겹겹이 교차하면서 문자의 층을 만든다. 그러면서 천자문을 넘어서는 무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얹힌 물방울은 존재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게 한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붓글씨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일은 작가가 자신을 비워내는 성찰과 수련의 과정이자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전시는 11월 29일까지.
서화동 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