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적자' 소니 폰의 변신…"덩치 줄이되 5G폰 계속 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니, 3분기 영업익 3.4조…사상 최대 실적
스마트폰 출하량도 2분기부터 안정세 돌입
스마트폰 출하량도 2분기부터 안정세 돌입

3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최근 3분기(7~9월) 재무 보고서를 통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조4455억원(3177억6000만엔)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소니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게임 수요가 늘면서 사업 호조를 나타낸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과 '게임 구독 서비스' 사업 등이 눈에 띄지만, 그간 적자를 이어온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가 안정 추세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소니는 공식적으로는 모바일 사업부가 없어 스마트폰 사업 실적이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대신 자사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출하량을 공개한다. 소니는 2분기 80만대, 3분기 60만대를 출하했다.
2016년 4분기 510만대 출하 이후 계속 출하량이 줄어들어 올 1분기 40만대까지 곤두박질친 점을 감안하면 2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한 스마트폰 사업 체질개선이 본격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는 소니의 4분기 출하량이 1분기 대비 3배 늘어난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과 각종 가전제품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다가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후발주자들에게 밀렸다.
그러자 소니는 전자기기 등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과감하게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강수를 뒀다. 대신 자사의 강점인 금융, 플레이스테이션, 이미지 센서, 음악 및 영상 사업 등을 키워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부활했다.
그럼에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스마트폰 사업은 여전히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진 않았다. 대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스마트폰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여러 번의 사업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 내수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영업·마케팅 화력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해 경영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니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과 영상 제품·솔루션(IP&S), 홈엔터테인먼트·사운드(HE&S)를 전자제품·솔루션(EP&S) 사업부로 통합 개편했다. 이어 올 4월엔 중간지주회사 '소니전자'를 설립해 EP&S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사했다.
스마트폰 사업은 이어나가되 사업부는 사실상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소니 관계자는 "소니전자는 각 사업부를 통합하고 조직 구조·인력·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로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대적 사업 개편에 나선 소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올 초 소니의 첫 5G(5세대 통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1 II 5G'와 중급형 '엑스페리아 10 II' 등을 출시했다.
지난 9월엔 하반기 주력 스마트폰 '엑스페리아5 II 5G'를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엑스페리아5 II 5G는 6.1인치 디스플레이에 21:9 화면 비율, 120헤르츠(Hz) 주사율을 지원하며 퀄컴 스냅드래곤865 프로세서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프리미엄 라인업 중 이례적으로 3.5mm 유선 이어폰 단자도 장착했다.

자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안 팔리는 지역에서 굳이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며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이후 스마트폰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전자업체에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5G 스마트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규모 축소에 철수설까지 불거지자 요시다 켄이치로 소니 사장은 직접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은 사업 분야로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보통신(IT) 매체 안드로이드 오토리티는 "소니의 모바일 사업은 몇 년간 끔찍한 시간을 견뎌왔다"면서도 "올해 2분기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년 대비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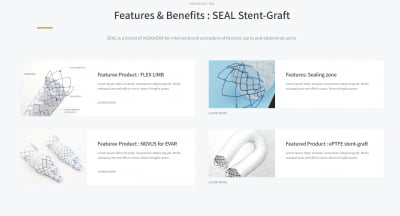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