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한·일관계 개선 도울 수도
국중호 < 日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1868년 에도(江戶) 무사정권을 마무리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 신정부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두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뒤 군부의 힘이 강해졌고 군부 세력에 대항할 견제력은 갖춰지지 못한 채 제국주의로 바뀌어갔다. 한반도는 일본에 병합됐고 무단통치가 이어졌다. 정당정치가 무력화되며 거국일치(擧國一致) 내각이 들어섰고, 마침내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무모함을 범했다.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전쟁은 끝이 났다. 반작용이 작동되지 못해 수백만 명의 인명 희생을 초래한 끔찍한 사례다.
반작용의 미작동은 전후에도 이어졌다.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지배할 때 민주주의 헌법이 주어졌으나 정당을 물갈이하는 정치 체제는 갖추지 못했다.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은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곤 지금까지도 거대 여당으로 군림한다. 이를 보고 “여태껏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일본에서 우경화가 심해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을 틀었을 때다. 실제로 아베 신조 우익 정권에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일본에선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 “이유가 많다”며 꺼린다. 일본의 국가주의(내셔널리즘)는 정부 비판 목소리를 잠재웠고 일본인들의 비판 의식 세포를 퇴화시켰다. 더불어 자기 견해를 관철하려는 개인의 능동성도 사그라지게 했다.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방식은 등한시됐고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으며 논의를 피해왔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렵게 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일본인들의 처신술 갈등 성향은 요즘 들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가 1906년 발표한 《풀베개(草枕)》라는 소설에는 세상살이에 대한 번뇌가 가득 엮여 있다. 특히 소설 첫머리에 토로한 구절이 유명하다. “이유를 들면 각(角)이 선다. 정(情)에 휘둘리면 흘러가버린다. 고집을 부리면 옹색하다. 아무튼 인간 세계는 살기 어렵다.(7쪽)” 현재를 사는 일본인 심금(心琴) 속에서도 공감되는 문구다.
일본에서 반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스스럼없는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수동적 처신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일본인들의 심리 속성을 능란하게 이용한다. 바이든은 그간의 트럼프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품위를 되찾겠다고 나섰지만, 자민당이 지배해온 일본에선 전임자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다행히 바이든은 국제협조 복귀를 선언했고 한·일 관계 악화나 인권 관련 역사 문제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시계추가 돌아온 지금이 기회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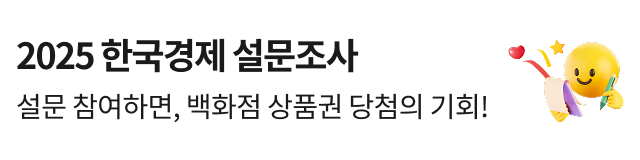
![[세계의 창] 美·中 관계에 대한 리콴유의 통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7.21171237.3.jpg)
![[세계의 창] 비판 의견 길들이려는 日 스가 정권의 근시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7.21008157.3.jpg)
![[세계의 창] 스가는 어떻게 일본 총리가 됐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7.210081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