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급결제 관리권한' 요구에…한은 "관치금융 하나" 강력 비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놓고 갈등
금융위 "현 제도 빅테크 관리 못해"
금융위 "현 제도 빅테크 관리 못해"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를 강력하게 공식 비판했다. 금융위가 지급결제제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은은 ‘관치금융’ ‘과잉규제’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한은은 25일 의견문을 내고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지급결제 시스템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반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 업체의 내외부 거래 시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에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한은법 28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리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 대상이 된다”며 “금통위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운용해야 지급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결제 위험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은 경영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기관 관리 권한을 넓히려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영역 다툼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으로는 국내 진출을 노리는 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융혁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익환/임현우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은은 25일 의견문을 내고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지급결제 시스템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반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 업체의 내외부 거래 시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에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한은법 28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리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 대상이 된다”며 “금통위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운용해야 지급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결제 위험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은 경영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기관 관리 권한을 넓히려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영역 다툼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으로는 국내 진출을 노리는 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융혁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익환/임현우 기자 lovep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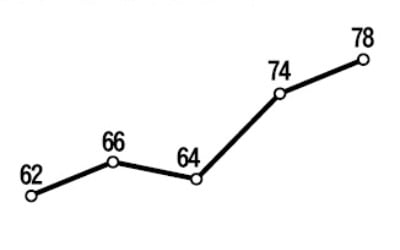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