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에서 백성을 5가(家) 단위로 묶어 서로 감시토록 한 십오제(什伍制)를 실시한 이후 동양 사회에선 백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상시화됐다. 수·당대엔 야간 통행금지까지 본격화했다. 수도 장안을 바둑판처럼 108개의 방장(坊牆)으로 나눠 주간에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벽과 저녁 북소리에 따라 성문이 개폐됐고, 모든 사람이 황제가 만든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밤에 월장하면 태장 20회의 중죄형에 처했다.
조선에서도 1395년 한양성이 완공됐을 때부터 종각의 종소리에 맞춰 사대문을 여닫았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 ‘인정(人定)제도’는 치안 유지의 핵심 방편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야간 통행금지는 미 군정 때인 1945년에 시작돼 1982년까지 37년간이나 이어졌다. 지금도 장·노년층에선 밤 12시가 되면 울리던 ‘통금 사이렌’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빛바랜 역사책 속 한 장면 같던 ‘야간 통행금지’가 새롭게 소환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서울에서 밤 9시 이후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이 문을 닫고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30% 감축 운행하는 등 사실상 통금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일상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됐다.
‘통금의 부활’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가 밤에만 걸리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은 미봉책일 뿐, 코로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그 효과에 한계가 분명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대중의 불신을 자극할 위험도 크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로나 초기 때나 도시 봉쇄, 통행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취했지 최근엔 근본 대책인 백신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편으론 사실상의 야간 통금으로 각종 연말 모임이 소멸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귀가 시간은 빨라졌고, 2차·3차 모임은 옛말이 됐다. 밤 9시 이후엔 집 말고 갈 곳도 없다. ‘야간 통금’이 집단 이익과 개인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삶의 방식도 크게 바꿀 것 같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


![[천자 칼럼] 인구 100만 '특례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612597.3.jpg)
![[천자 칼럼] 전기차 '충전 난민'](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599593.3.jpg)
![[천자 칼럼] '신조어 공장' 부동산 대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58739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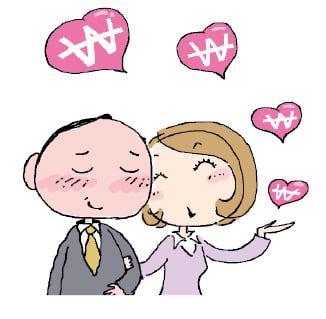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