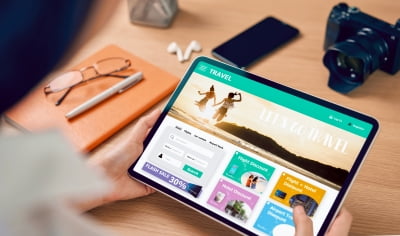코로나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나 운동의 필요성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를 더 파고들어야지, 선의(善意)에만 주로 기대는 듯한 발상에 답답함도 느껴진다. 주주이익을 중심에 둬야 할 기업을 반(半)강제적 이익공유제로 몰아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권 모습에서 10여 년 전 ‘차카게 살자’란 문신을 한 폭력배 사진이 오버랩되는 건 인지상정이다. 속내는 순수했을지 모르나, 틀린 맞춤법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일그러진 잣대로는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일삼으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율배반까지 안 가면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선과 악을 무 자르듯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세상사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씨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착한 동기로 시작한 행위일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결과도 나쁘다면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국민을 위한다는 미사여구 동원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프로파간다(여론에 영향 미치려는 커뮤니케이션)에선 경쟁자를 ‘매도’하거나, ‘보통사람’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외에 ‘미사여구’ 동원도 매우 중요시된다.
여권의 ‘착한 OOO’ 운동의 동기는 ‘정의’ ‘공정’ ‘포용’ 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그런 가치들이 수없이 훼손된 사례를 목격한 국민에게는 전혀 착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다. 나 자신부터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게 경제정책이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능)에 맡겨보라는 애덤 스미스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


![[천자 칼럼] 수소로 눈 돌리는 산유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A.25054688.3.jpg)
![[천자 칼럼] 계란값과 밥상물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A.25042347.3.jpg)
![[천자 칼럼] 社名·로고의 이유 있는 변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A.2503096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