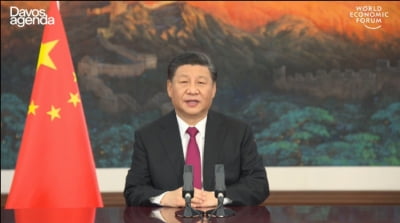작년 선물시장서 단기 급등했지만
풍작에 수요까지 줄어 다시 '뚝'
"잘못된 전략 탓에 농가 직격탄"

세계 코코아 시장은 최근 수개월간 혼란을 겪고 있다. 각각 세계 코코아의 40% 이상과 20%를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손을 잡고 가격을 조정하려 한 영향이다. 양국은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코코아에 대해 t당 120달러가량의 ‘품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작년 10월엔 코코아 농장 노동자의 생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코아에 t당 400달러 프리미엄(LID)을 새로 붙였다.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은 코코아 시장의 OPEC 격인 ‘COPEC’을 결성해 코코아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가격 카르텔 전략은 초반부터 엇나갔다. 글로벌 초콜릿 대기업들이 다른 판로를 통해 코코아를 확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미 최대 초콜릿 기업 허쉬는 현물시장 중개상 대신 미국·영국 선물시장에서 직접 코코아를 사들였다. 작년 11월 코코아 선물가격이 단기 급등한 이유다. 이 같은 움직임에 코코아 중개상들은 현지 매입을 줄이고 매입 가격도 낮췄다.
선물시장 가격 상승세도 오래가지 못했다. 세계 코코아 수급 상황 탓이다. 양국에선 코코아 대풍작으로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 반면 세계 초콜릿 수요는 평년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호텔, 면세점 등 주요 초콜릿 수요처가 영업을 줄여서다.
이에 따른 타격은 코코아 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로이터는 “각 농가 창고에 코코아 원두가 쌓이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코코아 수확철을 거치면 또 엄청난 재고가 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고가 많아질수록 주요 생산국의 세계 시장 가격 협상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카르텔이 성공하려면 수급 상황이 핵심인데,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당국은 이를 놓쳤고 그 대가를 각국 농가가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