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인기...한국 IT 업계도 열광

모두가 잠든 4일 새벽 2시께. ‘클럽하우스’의 한 채팅방에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으로 꼽히는 토스의 이 대표와 차기 유니콘으로 주목받는 지그재그의 서정훈 대표 등이 나누는 음성 대화를 듣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토스가 최근 시도하는 것들이나 기업 문화 등을 털어놓기도 하고, 클럽하우스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방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도 청취자로 참여했다.
머스크 등 유명인과 음성 채팅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클럽하우스의 인기가 한국에도 상륙했다. 클럽하우스는 2020년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인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음성 기반 쌍방향 SNS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참여해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일대다로 소통하는 팟캐스트와 달리 다대다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톡의 ‘그룹콜’ 기능과 유사하지만 나와 친구(팔로우)가 아닌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용자들은 언제든 여러 방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방을 개설할 수도 있다. 방을 만든 사람(모더레이터)은 누가 대화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고, 관심 있는 사용자들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용자들은 내가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원숭이의 두뇌에 칩을 심는 데 성공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인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머스크가 참여한 방은 한도 인원 5000명을 꽉 채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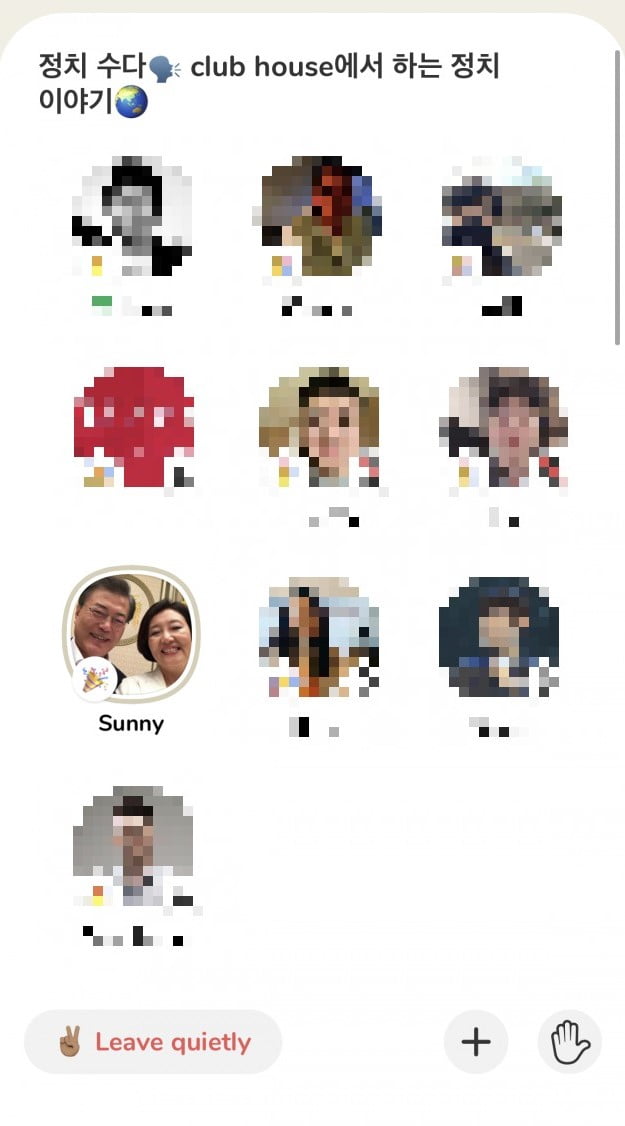
뒤처질까 불안...‘FOMO’ 자극해
클럽하우스는 대화 내용이 전혀 남지 않아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 사용 기기에서 녹화기능을 켜면 앱에서 녹화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뜨며, 여러 번 시도하면 차단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용자들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나만 소외됐다는 두려움)를 건드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렌드에 빨라야 하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클럽하우스가 ‘필수 SNS’로 빠르게 자리 잡은 배경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클럽하우스는 이미 주간 활성 사용자 200만명을 확보했다.중세 상류사회의 고급 회원제 클럽 문화인 ‘커피하우스’처럼 특정 자격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점도 인기 요소다. 가입만 한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용자가 초대장을 보내주거나, 이미 가입한 지인이 입장을 허용해줘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를 이용하려면 초대장을 받아야 했던 것과 유사하다. 초대장도 한정돼 있다. 처음 가입했을 때 단 두 장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을 많이 해야 초대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는 초대장 없냐’는 요청 글이 수두룩하고, 초대장을 사고파는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클럽하우스가 차세대 대표 SNS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대 데이터블 대표는 “음성형 트위터와 같은 클럽하우스가 ‘줌’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영상 채팅에 지친 사람들이 얼굴과 옷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채팅에 열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김진원 기자 nykim@hankyung.com




!["혐오스럽다" MS 'AI 비서' 직격한 세일즈포스…야심작 대공개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754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