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악의 평범성', '희망'이란 단어 하나도 없지만…"절망·좌절않겠다" 의지 드러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산하 시집 '악의 평범성'
꿈과 신념이 잿더미 된 세상
어떤 자세로 살까 일깨워
꿈과 신념이 잿더미 된 세상
어떤 자세로 살까 일깨워

이산하 시인(61·사진)은 최근 출간한 세 번째 시집 《악의 평범성》(창비)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단테의 《신곡》 구절을 언급하면서다. 질곡의 한국 현대사에서 모순적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온 이 시인은 “현대사 앞에서는 우리 모두 문상객이 아니라 상주”(시 ‘나를 위해 울지 말거라’ 중)라고 했다. 사회의 모순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세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시인은 제주 4·3항쟁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27세에 쓴 장편 서사시 ‘한라산’으로 옥고를 치렀다. 긴 절필 끝에 1999년 두 번째 시집 《천둥 같은 그리움으로》를 냈지만 또다시 시쓰기를 멈췄다. 모순에 저항하며 상처를 받았던 그의 날 선 시선은 22년 만에 나온 이번 시집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 겉으론 보드랍고 온화하고 민주적인 표피로 포장돼 있지만 지금의 현실 역시 여전히 양상과 방식만 달리한 채 불의와 불합리,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다. 악으로 인해 꿈과 신념이 잿더미가 된 세상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삶의 바퀴를 굴리고 있어서다. 희망은 없을지언정 절망도 좌절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나를 찍어라/그럼 난/네 도끼날에/향기를 묻혀주마’(‘나무’ 중)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했던 농부작가 전우익의 휠체어가 등장하는 시 ‘산수유 씨앗’도 마찬가지다. ‘두바퀴를 두 손으로 직접 굴리는 이 휠체어는/천천히 손에 힘을 주는 만큼만 바퀴자국을 남긴다’.
김수이 문학평론가는 “그 휠체어 바퀴자국은 앞세대와 뒷세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며 인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며 “타인에 대한 발걸음”이라고 해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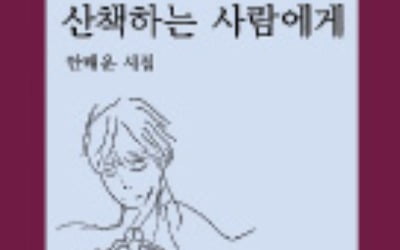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