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OECD 세금 비교
법인·재산세로만 쏠려
재산세 비중은 OECD 2배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재산·법인세에 쏠린 세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발표한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 중 재산세 비중은 11.6%로 OECD 회원국 평균(5.6%)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37개 OECD 회원국 중 영국(12.5%)과 미국(12.3%) 다음으로 높았다.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10%)보다 1.5배 높은 15.7%를 차지했다.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기업의 주요 경쟁 상대가 많은 미국(4.1%)과 독일(5.6%)에 비하면 세 배가량 높았다.소득세와 법인세 집중도는 OECD 평균을 밑도는 4개 주요 세금과 대조를 보였다. 소득세 비중은 18.4%로 OECD 회원국 평균(23.5%)을 밑돌았다. 전체 32개국 중 25번째 순위다. 부가세(15.3%)와 사회보장분담금(25.4%)도 각각 29위와 24위에 그쳤다.
이런 세수 구조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 재원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의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약 22조원(64%) 불어났다. 정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선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보편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정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증세 방안에 소극적이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이유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올렸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올해부터 두 배가량(0.6~3.2%→1.2~6.0%) 뛴다. 집값 상승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재산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형적 세수 구조로 경제 위축”
기형적인 세수 구조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16조7000억원(23%) 줄었다”며 “세율을 높이더라도 민간 성장동력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끌어내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법인세 부담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39%(722만 명)가 면세근로자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법인 비중도 49%에 육박한다. 유 의원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코로나19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데, 면세자가 많으니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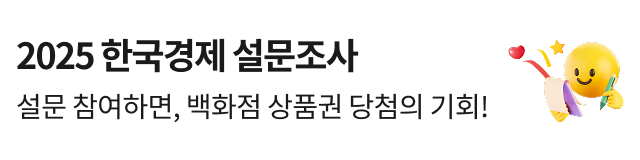

!["AZ 백신 얼마나 위험하길래?"…역풍 부른 '文 대신' 챌린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178962.3.jpg)

![[단독] 징벌적 과세로 세수 메꾼다…한국 재산세 OECD 3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4879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