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롯데케미칼' 일군 엔지니어 출신 CEO
백악관서 트럼프 면담 첫 韓 기업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야"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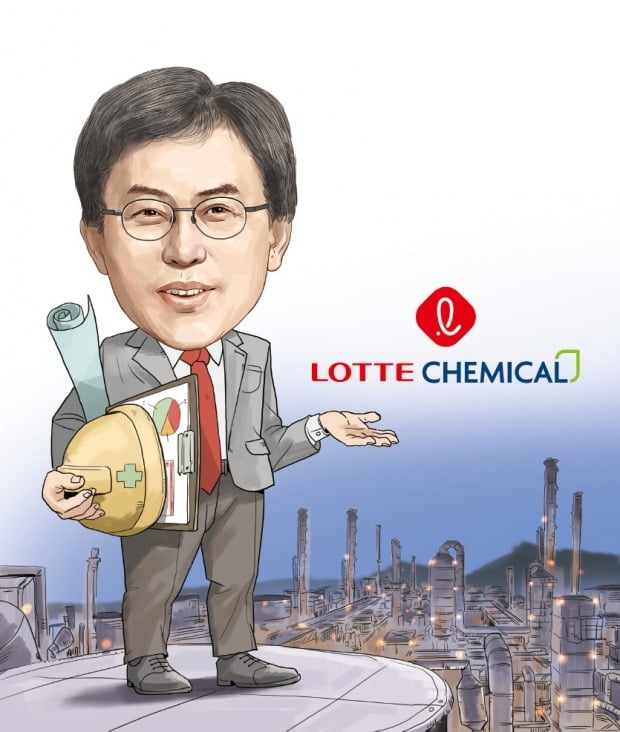
신 회장을 도와 이 면담을 막후에서 조율한 사람이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백악관 면담 일정을 잡은 것도, 면담의 단초가 된 루이지애나 공장 설립을 끝까지 추진한 것도 김 사장이었다. 롯데케미칼의 주요 해외 진출에는 늘 그가 있었다. 말레이시아 타이탄 인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공장 설립 등이다. 김 사장은 롯데케미칼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韓 기업 최초 미국 화학공장 설립
루이지애나 공장은 2012년부터 기획된 것이다. 김 사장이 신규사업 임원(전무)일 때다. 회사의 위기감은 당시 컸다. 미국과 중국 화학사들이 설비를 늘리고 급격히 덩치를 키운 영향이었다. 석탄, 셰일가스 등 값싼 원료를 쏟아부어 화학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다. ‘잡아 먹힐 바엔 호랑이 소굴로 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값싼 셰일가스로 제품을 생산해낸다면 싸워볼 만하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됐다. 유가가 떨어지면 셰일가스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화학사로선 이런 때 셰일가스로 화학 제품을 제조하면 손해다. 기존 방식대로 석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써야 경쟁력이 생긴다. 미국 현지에서 셰일가스 관련 프로젝트 7개가 줄줄이 취소됐다. 한국 화학사들 상황도 비슷했다. 미국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곳들이 발을 뺐다.
신 회장과 김 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원료를 다변화해야 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수익구조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에 함께 진출하기로 한 24곳의 국내 건설·플랜트 업체의 사정도 감안했다. 결과는 적중했다. 공장을 가동한 2019년부터 흑자를 냈다. 김 사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1년 만에 타이탄 공장 정상화
김 사장은 미국 공장뿐 아니라 롯데케미칼이 추진한 해외 사업 대부분에 발을 담갔다. 2010년 인수한 말레이시아 타이탄케미칼(현 롯데케미칼타이탄) 인수도 그의 ‘작품’이다. 롯데는 말레이시아 최대 석유화학사인 타이탄케미칼을 약 1조5000억원에 인수했지만 시작은 위태했다. 막상 인수하고 보니 정비 소홀로 설비가 수시로 멈춰서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적자가 발생할 때도 있었다. ‘실패한 인수합병(M&A)’이란 말까지 들었다.롯데케미칼은 2014년 초 김 사장(당시 부사장)을 ‘해결사’로 보내 타이탄케미칼 대표로 선임했다. 김 사장은 나름 자신이 있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장을 잘 아는 데다 인수 작업을 총괄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 부임 후 매니저급 이상 직원들부터 불러 모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했다. 김 사장이 직접 교육을 담당했다. 왜 롯데가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했는지, 앞으로 비전이 뭔지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이 아시아 최고 화학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타이탄이 중심”이라며 자부심도 불어넣었다.
한편으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문제가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하는 일부터 고쳐 나갔다. 2016년 공장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해 타이탄케미칼이 거둔 영업이익은 5000억원을 넘겼다. 매출 2조원대 회사가 거둔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다. 한국에서 타이탄케미칼 공장을 견학 올 정도였다.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했다.
경영 신조는 ‘우문현답’
김 사장은 임직원에게 ‘현장의 힘’을 거듭 강조한다. “신사업 구상, M&A 같은 큰 의사결정뿐 아니라 제품 불량, 납기 지연 같은 운영상 문제점도 현장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제1 경영원칙이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인 이유다.김 사장은 스스로도 ‘현장통’이라는 평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엔지니어로 시작했다. 1984년 초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 여수공장 기술부에 발령받았다. 이후 프로젝트 프로세스 엔지니어,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증설 공정담당, 여수공장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지냈다. 해외 사업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신규사업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세 명으로 시작한 신규사업부는 2006년 정식 부서가 됐다. 부서의 첫 임원을 맡아 큰 프로젝트만 전담했다. 1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김 사장 손을 안 거친 곳이 없다.
그는 자금 조달에도 강점을 발휘했다. 해외사업 성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장 사업비 41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25억달러를 PF로 충당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또한 18억달러가 PF였다. 금융회사들의 깐깐한 요구를 맞춰야만 사업이 가능했다. 김 사장은 이들에게 최고의 파트너였다. 원료를 얼마에 살 것인지, 기술은 어디서 들여오는지, 임원은 누구를 영입할지 등 세세한 것을 이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전부 제시했다. ‘현장통’으로 설비와 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 회장이 그만큼 김 사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SG 경영 강화
김 사장이 현재 주력하는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다. 향후 10년간 총 5조2000억원을 투자, 대대적인 탄소 저감 노력과 친환경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 말 ‘경영본부’를 ‘ESG 경영본부’로 바꿔 사내 흩어진 ESG 조직을 하나로 모았다.10년 안에 친환경 소재 매출 6조원 달성이란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김 사장은 “친환경 사업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겠다”고 했다.
■ 김교현 사장은
△1957년 대구 출생
△1983년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
△1984년 호남석유화학 입사
△2009~2011년 호남석유화학 신규사업담당(상무), 신규사업총괄(전무)
△2014년 롯데케미칼 LC타이탄 대표(부사장)
△2017년 롯데케미칼 대표(사장)
△2020년~ 롯데그룹 화학BU장 겸 롯데케미칼 통합 대표(사장)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