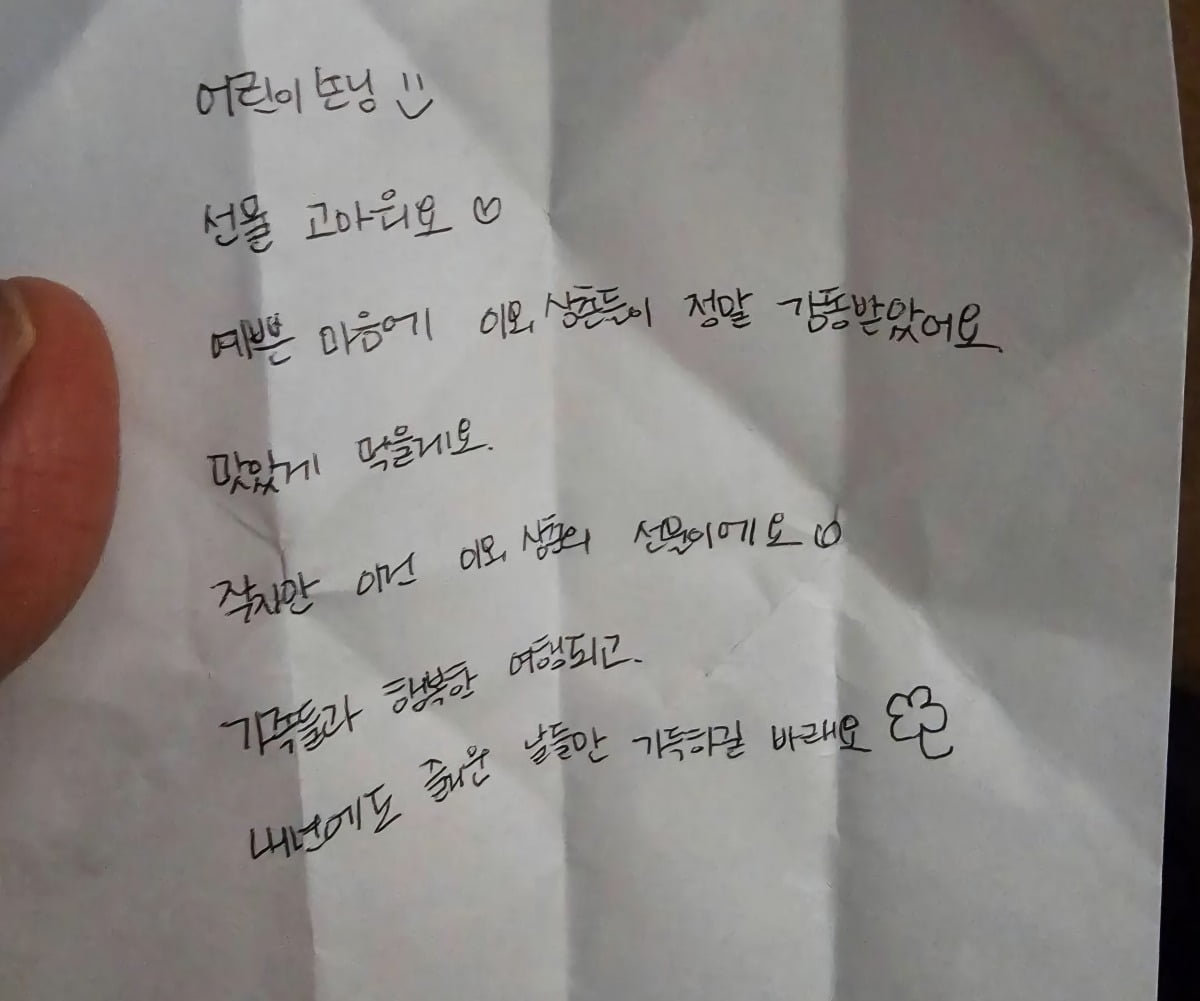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AI 전문교사' 배출한다지만
교수 수급·커리큘럼 혼선
컴퓨터·수학 전공자는 극소수
이시은 IT과학부 기자
AI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AI가 큰 걱정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비상 걸린 AI 교육’ 취재 보도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얘기다.
교육부가 ‘AI 교사 연간 1000명 배출’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교육대학원이 대표적 사례다. 이달 전국 38개 교육대학원이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AI 융합교육 전공’ 수강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 부산, 충북 등 각 지역 거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화여대 중앙대 부산대 등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았다. 서울대는 오는 2학기 25명 정원을 안배해 학과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 교수 인력부터 커리큘럼 문제까지 혼선이 가득하다. 교육과정을 면밀히 보면 정책의 성급함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담당 교수의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전공 주임 교수 자리의 대부분이 기존 사범대 교육학 전공자 출신으로 채워졌다.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진 역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출신이 대부분이다. 소프트웨어(SW)를 가르쳐야 할 컴퓨터공학 분야 교원은 겸임, 파견 형태로 대학마다 1~2명가량에 그쳤다. 수학 전공자 역시 거의 없다.
커리큘럼 문제도 있었다. 개설 취지가 ‘AI 전문 교사’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AI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고작 한두 개 편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고리즘 기초, 데이터과학 개론 등 핵심 과목도 부족했다.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등 너무 광범위해 개설 취지가 불분명한 과목도 있었다.
말 그대로 ‘융합’ 과정인 만큼 커리큘럼이 너무 상세할 필요는 없다는 항변도 있다. 교육학 전공 교수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융합 대학원’의 의미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관련 학부에서 배우는 지식의 절반 정도는 익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AI 융합 교육대학원이 ‘AI 전문 교사’를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