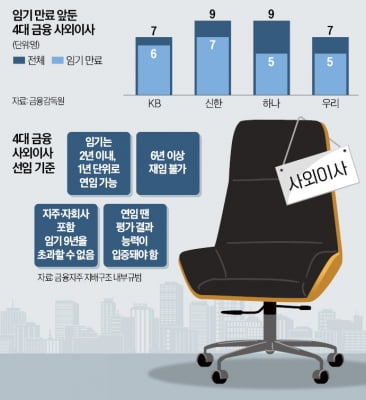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을 ‘초식학생’으로 키우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을 공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중고학생’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책 없는 미래에 불안감만 커져간다.
초등학생들은 조금만 새로워도 어쩔줄 몰라하면서 불안과 어려움을 느낀다. 대부분 학습은 자신이 생각하는게 아니라 베끼기가 대부분이며, 학원에서 주어진 지식을 낼름 받아먹기에 바쁘다. 하루종일 공부만 해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은 없다. 그들은 뭐든지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집에선 엄마가, 학교와 학원에선 선생님이 지시한대로 따라야 편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문제일까? 아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 부모들이다. 뭐든지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벌 숙제로 ‘명심보감’의 내용 중 한 부분을 옮겨 적으라고 했다. 다음날 숙제를 확인했던 선생님은 필체가 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른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미술시간에도 그림을 굳이 완성하려 하지도 않는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준비물은 부모가 챙겨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놓치고 가서 선생님께 혼이라도 나면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서 혼났다”며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부모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부모들의 과잉보호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푸른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게 아니라 하루 하루 겨우 주어진 들판에서 풀만 뜯어먹고 자라는 초식동물과 같다. 자신이 할 일도 부모가 챙겨줘야 생각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을 잃고, 어찌될까 두려워 판단조차 힘들고, 타인을 탓하며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자기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중,고등학생때는 더 심해지고, 사춘기에 다다른 아이들은 게임과 연예인 따르기가 돌파구처럼 생각하게 된다. 대학생때는 어떻게 하든지 취직만 하려고 스펙쌓는 것만 생각한다.
어느 순간 부터 부모들도 그렇고 사회도 모두 적정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과잉보호하지 않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워주도록 지켜보는 것, 불안하지만 아이들을 믿는 것,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적정선이 필요하며, 지출에도 적정선이 필요하며, 말에도 적정선이 필요하다. 이 선을 넘기면 어떻게든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다. 오늘 내가 넘은 적정선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생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몰락한 세계 2차 대전 요새…다시 일으킬 열쇠는? [K조선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28023.3.jpg)
!["중국인 반응 폭발"…'6000만원 車' 보름 만에 13만대 팔렸다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31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