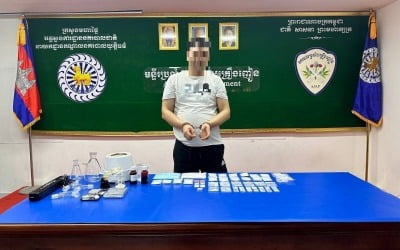묻 + 엄 -> 무덤으로 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묻었다는 것은 땅속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산소라고도 하고 한자어로는 묘지라고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묻었다

그러나 같은 공동묘지도 산비탈에 쓰는 경우도 있고
비좁은 공동묘지도 있다
영혼이 비좁은 것을 알는지는 모르지만

말은 그럴 듯하게 부도라고 하지만

쟁쟁하던 시절에 묻혔으면 고대광실 으리으리한 무덤이 되겠지만
다 쓰러져가는 고려말의 공양왕릉은 그저 초라하기만 하다


총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비석이 이병이었으니 훈련병으로 죽었다는 말이다
나라를 위하여 군인의 길을 가다가 죽었다지만
이병의 무덤은 정말 슬프다

나는 가족묘를 보면서 늘 느낀다
사이가 좋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오손도손하겠지만
원수 같던 사람들은 어쩔까?
가족묘는 매장묘가 서서히 납골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중간과정이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덤을 줄이자는 방안이다
화장을 한 후 두되 가량 나오는 유골이라는 뼈가루를 그저 강에 뿌리면 가장 좋을 것을
그것이 환경보호에 위배되는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몰래 산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온 묘안이 수목장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살아보니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산 사람의 몫이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 죽은 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달랑 두되도 안 되는 유골을 남길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십수년을 학교에서 배웠고
또 수십년을 사회에서 배우면서
그냥 먹기 위해 살다가
목숨 다해 죽으면 끝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유골을 남긴다
그러나 나는 유골만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
적어도 나 죽은 후 100년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남기련다
이 세상에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남기련다
내가 피흘리고 땀흘리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얻은 그 무엇인가를 남기련다
내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한
그 무엇인가를 남기련다
그 남겨진 것의 판단이야말로 후세들이 할 몫이고
내 몫은 그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이다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065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