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시] 저기 따뜻한 식탁 위에 빛나는 빵과 포도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겨울 저녁
유리창에 눈발 흩날리고
저녁 종소리 길게 울리는 시간.
따뜻한 집 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상이 차려져 있다.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
떠도는 사람이 문 앞으로 다가온다.
대지의 싸늘한 수액으로부터
황금빛으로 솟아오르는 은총의 나무.
나그네는 가만히 들어선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다.
거기 맑고 밝음 속에서 빛나는 저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
눈 내리는 저녁 풍경은 스산하다. 밖에서는 만종이 울리고 집 안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 긴 종소리의 끝자락으로 한 나그네가 나타난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오솔길들’을 헤쳐 왔을까. 차가운 대지에 뿌리박은 겨울나무는 수액조차 싸늘하다.
그러나 집안에서 퍼져 나오는 불빛을 받은 그 나무는 나그네에게 황금빛 ‘은총의 나무’로 비친다. 추위 속에 먼 길을 헤맨 방랑자에게 집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세계다. 그의 처지는 빛나는 은총이 아니라 아직 ‘어두운 오솔길’에 가깝다.
그가 오래 머뭇거리다 가만히 들어선다. 이 장면의 핵심어는 ‘가만히’다.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다’는 구절만이 과거 시제인 것은 그가 문턱을 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 문턱 너머, 맑고 밝고 빛나는 집 안에서 반짝이는 것. 배고픈 방랑자의 간절한 눈빛에 반사된 그것은 빵이다. 게다가 포도주까지 있다. 그러고 보니 그의 허기는 육신의 것만이 아니었다. 빵과 포도주란 기독교적 구원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이데거는 이 시 속의 집을 ‘인간이 지상에 거주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봤다. 몸과 마음의 안식처인 집은 곧 우리 삶의 공간이자 성찬(聖餐)의 현장이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땅과 하늘과 신적인 것과 사람이라는 네 요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천지인신(天地人神)의 합일’이 거기에서 이뤄진다.
이런 시를 쓴 게오르크 트라클은 1887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27세에 요절했다. 그의 작품은 많지 않지만 독특한 표현법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양식의 변화를 통해 현실의 혼돈을 극명하게 표현했다. 그것은 ‘특정한 연관이 없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나열문체’였다. 그는 ‘네 개의 시행 속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이미지들을 단 하나의 인상으로 짜 맞추는 비유적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 ‘겨울 저녁’에도 눈 내리는 날의 바깥 풍경과 집안 분위기, 방랑자와 빵, 대지와 문턱 등의 이미지가 나열돼 있다.
어릴 때부터 정신적 혼란을 겪었던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착란과 우수(憂愁), 불화와 절망까지 시에 담아냈다. 그의 시에 죄와 멸망, 속죄와 회개의 변주가 되풀이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여동생과의 비극적인 사랑, 죄의식에 따른 마약 복용, 끝없는 방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아픔은 그가 1차 세계대전 종군 중 육군병원 정신병동에서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할 때까지 되풀이됐다.
게오르크 트라클
유리창에 눈발 흩날리고
저녁 종소리 길게 울리는 시간.
따뜻한 집 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상이 차려져 있다.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
떠도는 사람이 문 앞으로 다가온다.
대지의 싸늘한 수액으로부터
황금빛으로 솟아오르는 은총의 나무.
나그네는 가만히 들어선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다.
거기 맑고 밝음 속에서 빛나는 저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
눈 내리는 저녁 풍경은 스산하다. 밖에서는 만종이 울리고 집 안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 긴 종소리의 끝자락으로 한 나그네가 나타난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오솔길들’을 헤쳐 왔을까. 차가운 대지에 뿌리박은 겨울나무는 수액조차 싸늘하다.
그러나 집안에서 퍼져 나오는 불빛을 받은 그 나무는 나그네에게 황금빛 ‘은총의 나무’로 비친다. 추위 속에 먼 길을 헤맨 방랑자에게 집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세계다. 그의 처지는 빛나는 은총이 아니라 아직 ‘어두운 오솔길’에 가깝다.
그가 오래 머뭇거리다 가만히 들어선다. 이 장면의 핵심어는 ‘가만히’다.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놓았다’는 구절만이 과거 시제인 것은 그가 문턱을 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 문턱 너머, 맑고 밝고 빛나는 집 안에서 반짝이는 것. 배고픈 방랑자의 간절한 눈빛에 반사된 그것은 빵이다. 게다가 포도주까지 있다. 그러고 보니 그의 허기는 육신의 것만이 아니었다. 빵과 포도주란 기독교적 구원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이데거는 이 시 속의 집을 ‘인간이 지상에 거주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봤다. 몸과 마음의 안식처인 집은 곧 우리 삶의 공간이자 성찬(聖餐)의 현장이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땅과 하늘과 신적인 것과 사람이라는 네 요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천지인신(天地人神)의 합일’이 거기에서 이뤄진다.
이런 시를 쓴 게오르크 트라클은 1887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27세에 요절했다. 그의 작품은 많지 않지만 독특한 표현법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양식의 변화를 통해 현실의 혼돈을 극명하게 표현했다. 그것은 ‘특정한 연관이 없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나열문체’였다. 그는 ‘네 개의 시행 속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이미지들을 단 하나의 인상으로 짜 맞추는 비유적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 ‘겨울 저녁’에도 눈 내리는 날의 바깥 풍경과 집안 분위기, 방랑자와 빵, 대지와 문턱 등의 이미지가 나열돼 있다.
어릴 때부터 정신적 혼란을 겪었던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착란과 우수(憂愁), 불화와 절망까지 시에 담아냈다. 그의 시에 죄와 멸망, 속죄와 회개의 변주가 되풀이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여동생과의 비극적인 사랑, 죄의식에 따른 마약 복용, 끝없는 방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아픔은 그가 1차 세계대전 종군 중 육군병원 정신병동에서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할 때까지 되풀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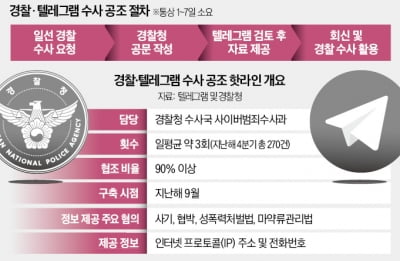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