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중국의 시(詩)는 당나라에서 몇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한다. 한자 시어가 당나라 시대에 그만큼 꽃을 피웠다는 얘기다.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 시선(詩仙)으로 추앙받는 이백은 당나라 문학을 만개시킨 주인공이다. 이백(701~762)이 두보(712~770)보다 10년 정도 앞서 태어났다. ‘이태백이 놀던 달아~’ 때의 태백(太白)은 이백의 자다.
이백이 벗 왕십이에게서 ‘한야독작유회(寒夜獨酌有懷·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회포를 읊다)’라는 시 한 수를 받고 답신을 보냈다. 그는 장편의 답시에서 무인을 숭상하고 문인은 경시하는 당시 당나라 세태를 열거했다. 투계(鬪鷄)나 즐기는 자가 천자의 총애를 받고 변방에서 작은 공을 세운 자가 충신이나 된 듯 으스대며 다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문인은 시부(詩賦)나 지으며 세월을 보낼 뿐 아무리 글이 뛰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의 마지막 시 구절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내저으니(世人聞此皆掉頭),
마치 봄바람이 말 귀를 스쳐가는 것과 같네(有如東風射馬耳)
이백은 자신의 글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세태를 ‘봄바람이 말 귀를 스치는 것(馬耳東風)’으로 표현했다. 시인다운 묘사다. 하지만 현재의 처지가 이렇더라도 억지로 부귀영화를 바라지는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시를 맺는다. ‘쇠귀에 경 읽기’ 우이독경(牛耳讀經), ‘소 앞에서 거문고 타기’ 대우탄금(對牛彈琴)도 뜻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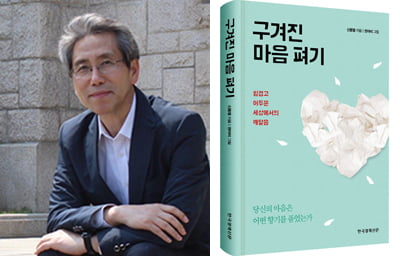
신동열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이재명 찢어야" "윤석열 벌 많이 받고"…분노의 현수막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63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