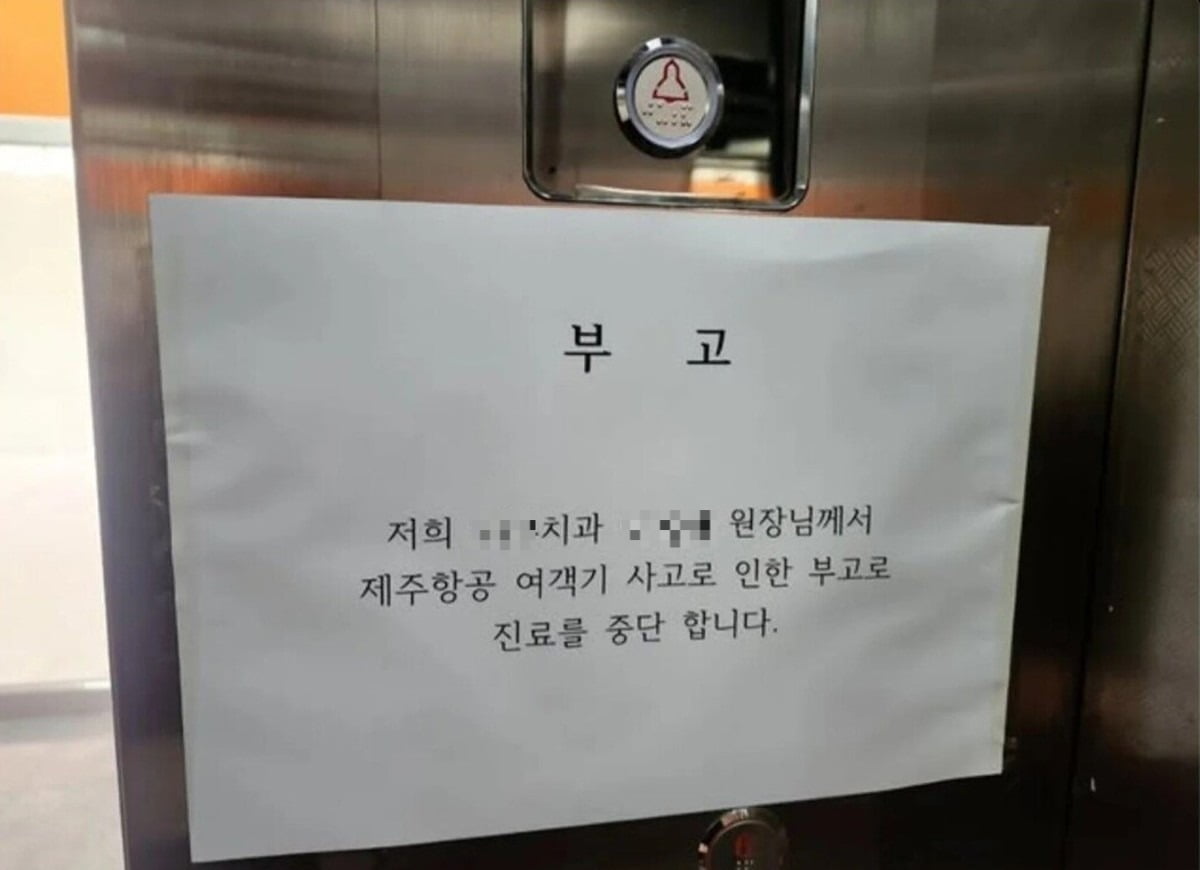위안부·징용공 등 과거사 문제로 비롯된 비정상적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생산적이지 못한 갈등과 대립이 경제와 안보 협력뿐 아니라 문화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 곳곳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한 축을 함께 구축해 왔으면서도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갈등’을 겪는 등 서로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전통적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 핵을 억제하는 국제공조에 균열을 초래했다. 중국의 패권적 행보가 거칠어지면서 동북아 지역안보가 불균형·불안정 조짐인 것도 엇나간 한·일 관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관계 개선을 정부에만 맡겨둘 수도 없는 게 유감스런 현실이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상의 회장회의를 재개하자는 최 회장 제안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양국 상의 회장회의는 2002년부터 매년 이어온 민간협력 채널이다. ‘정부발 과거사 갈등’ 여파로 중단된 이런 의미 있는 채널부터 잘 살려낼 때가 됐다.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간 고비마다 경제계가 역할을 해왔다. 유권자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상호 윈윈 전략하에 미래를 보며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게 기업인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일본 상의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뒤늦게 화해 제스처를 던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차제에 대한상의에 ‘미션’을 당부하고 힘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 닥치면 협력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일본 정부와 재계의 긴밀한 관계는 그런 점에서 부러울 정도다.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는 떨쳐내야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건전한 공조·협력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더없이 중요하다. 코로나 이전 대통령 순방외교가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 경제단체들도 국제협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기업을 적폐처럼 여기면서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이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할 때다. 상의가 한·일 관계 개선의 창구가 돼 실질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