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 기술자가 만든 자동차 에어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토 확대경

헤트릭의 발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또한 미 해군에서 어뢰 개발을 담당했던 경험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압축력을 높이는 데 매진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스크루를 돌리는 힘도 강해져 속도가 빨라졌다. 적이 어뢰를 탐지하기 전 목표물의 타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즉 ‘어뢰 속도 높이기’가 에어백 발명으로 연결된 셈이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나타났다. GM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에어백을 안전 품목이 아니라 원가 상승만 가져오는 불필요한 장치로 인식했다. 게다가 개인에게 특허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엔지니어 집단인 기업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도 했다. 헤트릭의 특허 만료 기간이 지난 1971년에야 최초의 상업용 에어백이 적용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67년 에어백의 사업화 가능성에 확신을 가진 인물은 사업가이자 발명가였던 앨런 K. 브리드(1927~1999)였다. 그는 에어백이 널리 보급되려면 공기주머니의 팽창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래서 작은 튜브 속에 쇠구슬을 넣어 움직임을 충격으로 감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평상시엔 구슬이 자석에 붙어 있지만 충격을 받아 떨어지면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원리다. 구슬이 튜브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BIT(Ball-In-Tube)’ 센서로 불리는 등 당시로선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비용 부담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던 탓이다.
앨런 브리드는 포기하지 않고 압축공기로 주머니를 부풀리는 대신 아지드나트륨을 기폭제로 활용해 팽창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자 결국 미국 내 자동차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크라이슬러가 에어백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가 관용차 구매 조건으로 에어백 적용을 내걸자 GM과 포드도 앞다퉈 적용했다. 특히 GM은 크라이슬러가 상용차에 적용한 것과 달리 미국 내에서 승용차 최초로 올즈모빌 ‘토로나도’에 에어백을 적용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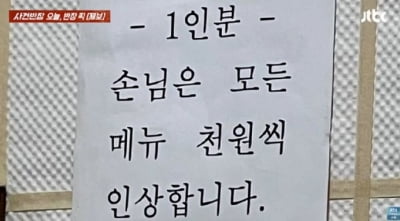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