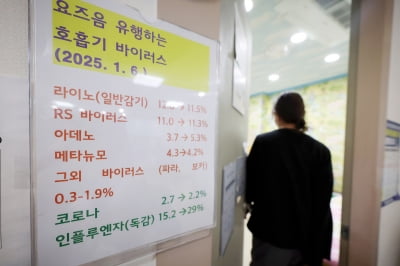20일 서울 인사동 선화랑 ‘진달래-축복’ 전시장에 들어서자 아마포에 그린 김정수의 ‘축복 연작’이 관객을 맞았다. 대바구니에 소복이 쌓인 진달래꽃이 고봉밥처럼 푸짐하다. 모양보다 눈길을 끄는 건 색채다. 평론가들은 그려진 꽃 색을 보고 “실제 꽃보다 더 진짜 같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림의 꽃 빛깔은 아침 햇발을 머금은 산속 진달래꽃의 색을 표현한 겁니다. 유화물감으로 이 색을 내는 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색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제대로 따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려도 소용없어요. 진달래꽃 잎은 딴 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색이 짙어져 철쭉처럼 보입니다. 이 색은 내 마음의 진달래꽃 빛깔에 맞도록 데포르마시옹(변형)을 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바구니 사이 새어나오는 빛깔이나 꽃잎에 붙은 가지와 싹도 내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홍익대 미대에서 공부한 그는 1983년 프랑스 파리로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전위적인 설치작품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아 영주권도 얻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다. 그는 “별안간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적인 소재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나긴 슬럼프가 찾아왔다. 미술을 그만두고 현지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업도 해봤지만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소재를 찾기 위한 방황 끝에 내린 결론이 진달래꽃이다.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것도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들 덕분이니까요. 고민하던 중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진달래꽃잎을 하나씩 던지며 ‘내 새끼 잘되게 해주소서’라고 소원을 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로 진달래꽃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달래 화가가 됐다. 이번 전시는 대바구니에 담긴 꽃잎을 그린 축복 연작 위주로 구성했다. 코로나19로 괴로운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다. 삼성과 협업해 만든 미디어아트 작품 등 35점이 나왔다. 전시는 5월 11일까지.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시인, 왜 사물을 의인화하는 걸까?…데카르트주의자는 될 수 없으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06774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