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착공 '시계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규제·떼법에 발목 잡힌 K반도체의 실상
행정규제 복잡하고 지역주민은 과도한 보상 요구
SK하이닉스 생산 계획도 영향…美·中은 '속도전'
행정규제 복잡하고 지역주민은 과도한 보상 요구
SK하이닉스 생산 계획도 영향…美·中은 '속도전'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이 내년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거북이 행정과 지역 이기주의로 산업단지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진 여파다. 국내 반도체기업이 제때 생산설비를 확충하지 못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용인시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산업단지 지정에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 일정까지 늦춰진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6개월~1년이 걸린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초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대상지 지정에서 공사 시작까지 3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지 선정 후 2년이면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는 미국 중국과 대조적이다.
클러스터 착공이 미뤄지면서 입주사인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5년 초 반도체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목표지만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공장 설립과 관련한 법령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기와 수도 설비를 갖추려면 전선과 파이프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5년이 소요됐다. SK하이닉스처럼 서울 인근에 공장을 지으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승인을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도 새로운 생산시설을 마련하려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 투기꾼들이 모여 땅값을 올리고,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업체에 족쇄를 달고 뛰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절차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22일 용인시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산업단지 지정에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 일정까지 늦춰진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6개월~1년이 걸린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초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대상지 지정에서 공사 시작까지 3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지 선정 후 2년이면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는 미국 중국과 대조적이다.
클러스터 착공이 미뤄지면서 입주사인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5년 초 반도체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목표지만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공장 설립과 관련한 법령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기와 수도 설비를 갖추려면 전선과 파이프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5년이 소요됐다. SK하이닉스처럼 서울 인근에 공장을 지으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승인을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도 새로운 생산시설을 마련하려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 투기꾼들이 모여 땅값을 올리고,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업체에 족쇄를 달고 뛰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절차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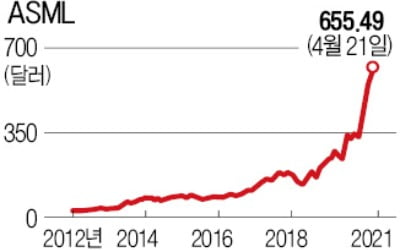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