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상한 나라’라며 폄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과거사 문제에 첨단기술과 전통,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된 일본 사회 고유의 특징까지 겹쳐 일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곳곳에서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다.
좋든 싫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세 권이 새로 나왔다. 무턱대고 일본을 찬양하거나 막연한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진면모’를 짚고자 노력한 책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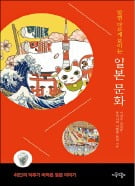
영화나 드라마로 낯익은 ‘도리아에즈 비루!(일단 맥주!)’로 시작해 ‘시메노라멘(마무리는 라멘)’으로 끝맺는 음주문화는 사람 사는 곳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반면 30만 개가 넘는 ‘성’부터 복잡한 한자 읽는 법은 같은 한자 문화권 내에도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며,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르는 일본인의 종교관은 일본 이해하기의 지난함을 상징한다.

‘칼의 윤리’는 패자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 선악의 기준보다 승패가 우선한다.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일본의 역사가 쓰였고, 정치와 경제가 작동했다. 우리와 다른 일본의 진면목을 살피는 데서 일본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문한다. 도식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일본을 이해해야 일본을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제시된다.

1909년 나가이 가후의 “일본인은 행복한 유토피아의 백성입니다”라는 발언에서 시작해 무샤노코지 시네아쓰의 ‘새로운 마을’, 사토 하루토의 ‘아름다운 마을’ 등으로 이어진 20세기 초반 일본 유토피아 문학의 양상은 특수하면서 보편적이다. 근대화와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함께 농촌사회에 대한 동경이 섞인 20세기 초 일본인의 정신세계는 복합적 존재로서 일본인의 특징을 부각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책마을] K팝·K방역…'K열풍'으로 90년대생을 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38744.3.jpg)
![[책마을] 거장 아바도가 아이의 시선에서 쓴 음악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38812.3.jpg)
![[책마을] 냄새 잘 맡을수록 풍성해지는 인생](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40448.3.jpg)




![[단독] 강호동도 손 털었다…가로수길 빌딩 166억에 매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242354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