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시나 슈지 지음
이연식 옮김 / 재승출판
400쪽│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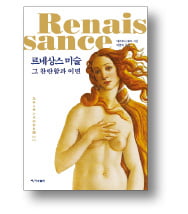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이자 일본 국립서양미술관 관장을 지낸 다카시나 슈지는 《르네상스 미술 : 그 찬란함과 이면》에서 이런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도 중세를 비롯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됐고 교회의 억압도 존재했으며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혼란은 당시 미술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피렌체의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는 1497년 광신도들을 조직해 그림과 음악, 문학 등 예술품들을 몰수한 뒤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허영의 불꽃’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행사엔 바르톨롬메오를 비롯한 당시 쟁쟁한 화가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습작을 불길 속에 모두 던져버렸다. “유럽 전체가 이 무렵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노년의 보티첼리가 갑자기 거칠고 음울한 작품을 연달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좌절과 우울에 시달린 시대이기도 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던 피렌체는 정작 이 사조의 전성기인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피렌체에서 자란 뛰어난 예술가들이 안목이 지나치게 높은 피렌체 시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등졌기 때문이다. 정도는 덜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예술가들은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모욕적인 비판을 각오해야 했다.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가 위대한 시대로 남은 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허용하는 역동성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거침없이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타치아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온전한 모습으로 남기기 위해 한껏 변주했다. 옷을 입은 모습과 알몸으로 두 차례 그린 데다 한 번은 정면을, 또 한 번은 옆모습을 그렸다.” 타치아노를 당대 최고의 화가로 만든 걸작 ‘성애와 속애’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책마을] '해적왕' 잡으려다 열린 대영제국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671155.3.jpg)
![[김동욱의 독서 큐레이션]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669369.3.jpg)
![[책마을] 생명의 말 없는 지휘관, 물리학의 세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66948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