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호황, 세계 각국에 금리인상 압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 GDP 25% 차지…强달러·인플레 영향 줘
올 3번 금리 올린 브라질·러시아 추가 인상 고려
올 3번 금리 올린 브라질·러시아 추가 인상 고려
미국 경제 호황이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도 미국발 변수에 따른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됐다고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중앙은행(Fed)은 지난 16일 올해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년 대비 7.0%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다수가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00~0.25%며, 기존 예상은 2024년 금리 인상이었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량에 달한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입도 늘어나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경제에는 호재다. 반면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급박해진 곳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다. 달러 강세로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커졌으며 인플레이션 후폭풍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 들어 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인플레이션이 8% 이상인 브라질과 6%를 넘긴 러시아는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9%로 올렸지만 리라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둔 국가의 경우 강달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역시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과도한 급등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와 체코도 기준금리를 곧 올릴 유력 후보 국가로 꼽힌다. 유럽연합(EU) 경제대국인 독일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4%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연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미 중앙은행(Fed)은 지난 16일 올해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년 대비 7.0%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다수가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00~0.25%며, 기존 예상은 2024년 금리 인상이었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량에 달한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입도 늘어나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경제에는 호재다. 반면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급박해진 곳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다. 달러 강세로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커졌으며 인플레이션 후폭풍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 들어 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인플레이션이 8% 이상인 브라질과 6%를 넘긴 러시아는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9%로 올렸지만 리라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둔 국가의 경우 강달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역시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과도한 급등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와 체코도 기준금리를 곧 올릴 유력 후보 국가로 꼽힌다. 유럽연합(EU) 경제대국인 독일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4%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연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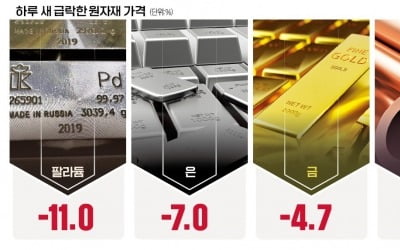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