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촛불은 (스마트폰의) LED 손전등으로,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로 바뀌며 점점 우리 삶에서 불꽃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이런 21세기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으로선 성냥을 팔아 손꼽히는 거부가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필자만 해도 최근 몇 년간은 생일 케이크를 사면 초와 함께 챙겨주는 성냥 외에 성냥을 사용해본 기억이 없으니 말이다.
성냥의 중요한 특징은 불을 오래 유지할 순 없지만 값싸고 쉽게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이 구축되기 전 요리, 조명, 난방 등 빛과 열이 필요한 모든 상황은 반드시 불꽃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20세기 초 성냥의 위상이 어땠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냥으로 부와 명예를 쌓아올린 게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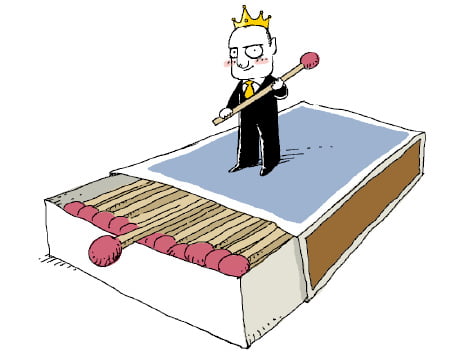
금융사기꾼 오명 쓴 성냥왕 크뤼게르
이렇게 쉽고 값싼 불씨로써 성냥이 인류의 삶에 깊이 침투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과학적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번째는 1669년 독일 연금술사인 헤니그 브랜드가 인(燐)을 발견한 것이다. 연금술사였던 만큼 브랜드의 관심사는 금이 아닌 물질에서 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보기에 따라서 황금빛을 내는 흔하디흔한 액체, 소변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대량의 소변을 모으고 졸이고 태우는 등의 가공을 거쳤는데, 당연히 금은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어두운 곳에서 오묘한 녹색으로 빛을 내는 물질을 얻었는데 이게 인(을 포함한 합성물)이다. 인은 어두운 데서 빛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쉽게 불이 붙었다. 당시만 해도 손쉽고 안전하게 불을 붙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브랜드가 이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지만, 브랜드는 흔하디흔한 소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상당히 오랫동안 비밀로 했다. 여담이지만 독일어로 브랜드가 ‘불’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연치고는 재미있는 일이다.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1844년 스웨덴 화학자 구스타프 파슈가 안전성냥을 개발한 것이다. 그 이전의 성냥은 대부분 성냥 머리로 누런색을 띠는 인, 즉 황린(黃燐)을 사용했는데, 이는 굉장히 불안정해 쉽게 자연발화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강해 여러모로 위험한 물질이었다.
생존 인물이 완성된 영웅?
파슈는 황린 대신에 황 기반의 물질로 성냥 머리를 대체하고, 별도의 마찰판에 적린(赤燐)을 발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성냥 머리를 마찰판에 긁으면 마찰에 의해 적린에서 작은 불꽃이 튀기고, 이 불꽃이 성냥 머리의 황으로 옮겨붙는다. 성냥에 처음 불을 붙이면 불꽃이 확 타오르는데, 황이 타오르며 생기는 현상이다. 그 불이 잠시 후 성냥의 나무막대로 옮겨붙고, 나무가 다 탈 때까지 성냥불을 사용할 수 있다. 수초간 지속되는 손쉽고 안전한 발화 도구가 인류의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다.그렇지만 파슈는 적린의 생산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1855년 들어서야 역시 스웨덴의 요한 룬스트롬에 의해 안전성냥 대량생산의 길이 열렸다.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성냥이 그 원리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스웨덴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크뤼게르라는 인물이 ‘성냥왕’으로 우뚝 섰다.
크뤼게르가 단순히 성냥만 잘 만들고 잘 팔아서 성냥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뛰어난 성냥만큼이나 금융 상품을 잘 만들었고 대단한 경영 수완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순환출자, 장부 외 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회계와 투자는 경제대공황과 함께 그의 몰락을 불러왔고, 결국 크뤼게르는 성냥왕이라는 별명 외에 희대의 금융사기꾼이라는 오명도 함께 쓰게 됐다. 이를 보면 현재 진행형인 인물에게 완성된 영웅의 서사를 씌워서 추켜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최형순 < KAIST 물리학과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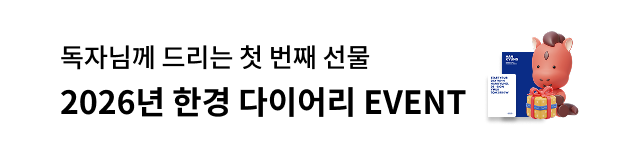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최형순의 과학의 창] 저온냉동고와 호기심의 쓸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7.21675932.3.jpg)
![[최형순의 과학의 창] 쟁기날 프로젝트와 전문성의 장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7.21675932.3.jpg)
![[최형순의 과학의 창] 성취 그리고 조력자의 희생](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216759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