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오른 최저임금이 달걀 한 판값…베네수엘라의 '살인 물가' [여기는 논설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자 출신 여성 작가의 ‘생지옥’ 고발
극한 빈곤 뚫고 탈출…자전적 소설로
‘스페인 여자의 딸’ 화제…곧 영화화
극한 빈곤 뚫고 탈출…자전적 소설로
‘스페인 여자의 딸’ 화제…곧 영화화

이런 상황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년에 몇 차례씩 올려도 살인적인 물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앞 다퉈 국경을 넘고 있다. 전체 인구 2800여만 명 가운데 600여만 명이 벌써 고국을 등졌다.
기자 출신 여성 작가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소설 <스페인 여자의 딸>(은행나무 펴냄)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치 없는 마천루’라고 표현했다.
‘아무도 지폐를 원하지 않았다. 지폐는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 기름 한 병을 사려면 100볼리바르짜리 지폐로 탑 두 채를, 가끔 치즈 한 덩이라도 사려면 세 채를 쌓아 올려야 했다. 가치 없는 마천루, 그게 국가 화폐였다.’
올 들어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300만 볼리바르를 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가 화폐단위에서 ‘0’을 여섯 개나 빼는 100만 대 1 화폐 개혁에 나섰다. 2008년 1000대 1, 2018년 10만대 1 비율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데 이어 세 번째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다위 변경)이다. 그런데도 물가가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뛴다.
![3배 오른 최저임금이 달걀 한 판값…베네수엘라의 '살인 물가'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839793.1.jpg)
카뮈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처럼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하는 이 작품에서 아델라이다는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잃고 집까지 빼앗긴다. 친여당 좌파 조직원들이 그녀의 집을 점거한 뒤 “경찰을 부른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경찰이야. 우-리-가”라며 내쫓는다.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우연히 옆집에 들어가다가 시신을 발견한다. 스페인계 여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그 딸의 여권을 이용해 스페인으로 탈출한다.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오랜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부재, 경제 파탄의 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다. 석유매장량도 세계 1위다. 그런 자원부국이 잘못된 정치 때문에 처참하게 망기졌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민간 석유기업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그 수입으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끝없이 펼쳤다.
당시는 고유가 시대였기에 오일 머니가 두둑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전면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중의 인기를 모았다. 2013년 그가 암으로 숨졌다. 후계자인 마두로 현 대통령도 대중 영합적인 무상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밀어붙였다.
그러다 2014년부터 국제 원유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가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 수입의 절대치인 원유값이 떨어졌는데도 그는 ‘퍼주기’ 정책을 고집했다. 국고가 바닥나자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냈다. 결국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고, 국민의 삶은 극단적으로 피폐해졌다.
그래도 땅속의 석유가 무궁무진하니 살아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국유화된 석유회사의 생산성은 날로 떨어졌고, 시설은 낡아갔으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전문 기술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멕시코와 미국 등으로 흩어져버렸다. 아무리 많은 ‘검은 황금’을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었다.
절대 빈곤과 국가적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어디서든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죽을 수 있었다. 총상, 납치, 강도.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정전에 이어 해가 지면, 영원한 어둠이 찾아왔다.’
작가는 폭력적인 좌파 정권을 ‘혁명의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혁명의 아이들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루었다. 그들은 선 하나를 그어 우리를 둘로 갈라놓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믿을 만한 자와 의심스러운 자. 비난을 야기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분열이 팽배하던 사회에 또 다른 분열을 더했다.’
생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탈출밖에 없었다. 떠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빠져나가야 할 땅에 가라앉고 말 테니까요. 나무들도 가끔은 장소를 옮겨 심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나무는 더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엄마, 나는 장작더미에 던져지는 병든 나무둥치처럼 불타고 싶지 않아요.”
소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작가도 베네수엘라를 떠나 스페인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과 작품 속 행간처럼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전 국민의 5분의 1이상이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한 와중에도 “이 모든 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며 외세 탓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與, 임기말 靑과 본격 선긋기?…인사 책임 요구·부동산 비판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82131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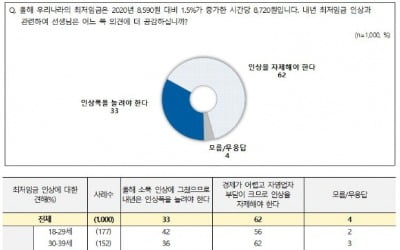
![중국을 향한 4가지 공개적 질의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806460.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