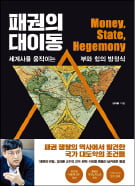
저자는 패권의 형성과 이동 과정은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고 전한다. 각 국가가 지닌 경제 체제의 속성과 재정 체제의 효율성을 함께 봐야 그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패권 국가들은 저마다 색채를 드러냈다. 스페인 제국이 영토에 집착했던 것은 봉건제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되던 시대의 속박을 받았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시기에 권좌에 앉았던 영국과 미국은 폭력보다는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경제력과 자유무역 교리를 앞세웠다.
과거사가 그랬다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될까. 패권 후보국의 경제 체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자원 규모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막대한 재정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중국은 미국에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평가다. 미국은 과연 ‘패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역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인의 기억과 관념,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서양 지식의 축적이 있었다는 사실, 일본의 국권 침탈이 치밀한 계획과 야욕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세 추종주의 외교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접하고 나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이 전승국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국교 재개 시점에서 한·일 간 국력 격차를 고려하면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교섭을 오늘의 시선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점도 일깨운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의 절대적·상대적 위치는 늘 유동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체, 한국의 급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력 전이(power shift) 현상이 나타났고, 일본 내에서 혐한론이 부상했다. 일본도 더는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없다. 만물은 유전(流轉)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주목! 이 책] 하루 10분 초등 독서록 쓰기의 기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878660.3.jpg)
![[주목! 이 책] 생애주기별 부동산투자로 부자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878644.3.jpg)
![[주목! 이 책]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878667.3.jpg)




![[단독] 강호동도 손 털었다…가로수길 빌딩 166억에 매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242354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