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현 지음 / 휴머니스트
640쪽 | 3만3000원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현대 역사학과 현실 정치에서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민족주의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다. 그중에서도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기억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각자 숨기고 싶어 하는 치부를 사정없이 들춰낸다.
저자가 돋보기를 들고 파헤치는 대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역사 분쟁을 이어가는 나라들이다. 홀로코스트와 대량살상이라는 비극적 역사로 얽힌 독일과 폴란드, 이스라엘이 한 축이요 식민주의와 민족탄압의 수렁에 빠진 한국과 일본이 다른 축이다. 통념과 달리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문서 수장고 속에 파묻혀 있던 영어와 독일어, 폴란드어, 일본어 자료를 수집·분석해 저자가 되살린 것은 단순한 이분법 속에 파묻혀서 들리지 않았던 역사의 비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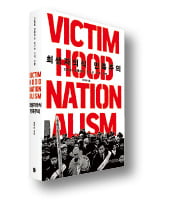
책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역사의 다면성을 강조한 전시장과도 같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으로부터 큰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동유럽 유대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 방관자였고, 일부는 유대인 핍박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해자이기도 했다.
‘희생자의 상징’ 격인 유대인들의 사정도 단순하지 않다. 시온주의를 표방한 이스라엘은 애초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이스라엘행을 거부하다 목숨을 잃은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봤다. 그러다 중동의 적들과 투쟁이 격화되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도를 바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전면에 내세웠다.
독일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전범 국가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역사의 피해자이자 연합국의 무자비한 보복 공격의 희생자로 여겼다. 융단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소련군의 집단 강간, 옛땅을 잃은 실향민이란 개인적 기억이 역사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렸다.
식민주의 침략과 난징대학살, 위안부, 강제노동 같은 반인륜적 행위의 주체였던 일본도 최초의 원자폭탄 피폭국이란 희생자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인은 자신들을 2차 대전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여겼고, 2차 대전 직후 만주와 한반도에서 유리걸식하며 복수의 대상이 되고 기아로 내몰렸던 일본인(히키아게샤)의 고난을 강조한다.
우리 역시 일제의 수족으로 연합군 포로 학대와 고문에 적극 참여한 조선인 간수 등 한국인 전범의 행위에 눈을 감았고, 1931년 전국적으로 번졌던 대대적인 화교 포그롬(조직적인 약탈과 학살)을 집단 기억에서 지웠다.
국경을 넘어선 기억을 둘러싼 파열음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저자는 희생의 기억에 관한 경쟁체제를 파기할 것을 주문한다. 자기 민족의 희생을 절대화하고 타자의 고통을 뒤에 줄 세우는 행위를 멈출 때 비로소 진실한 기억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무척 의문스럽지만 말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책마을] 7만년간 7번 세계화…인류는 '협력 DNA'로 위기 넘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08114.3.jpg)
![[책마을] 교육을 바꿔야 '실력'이 '재력' 넘어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09252.3.jpg)
![[책마을] 인터넷이 교묘히 숨긴 권력의 통제와 감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076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