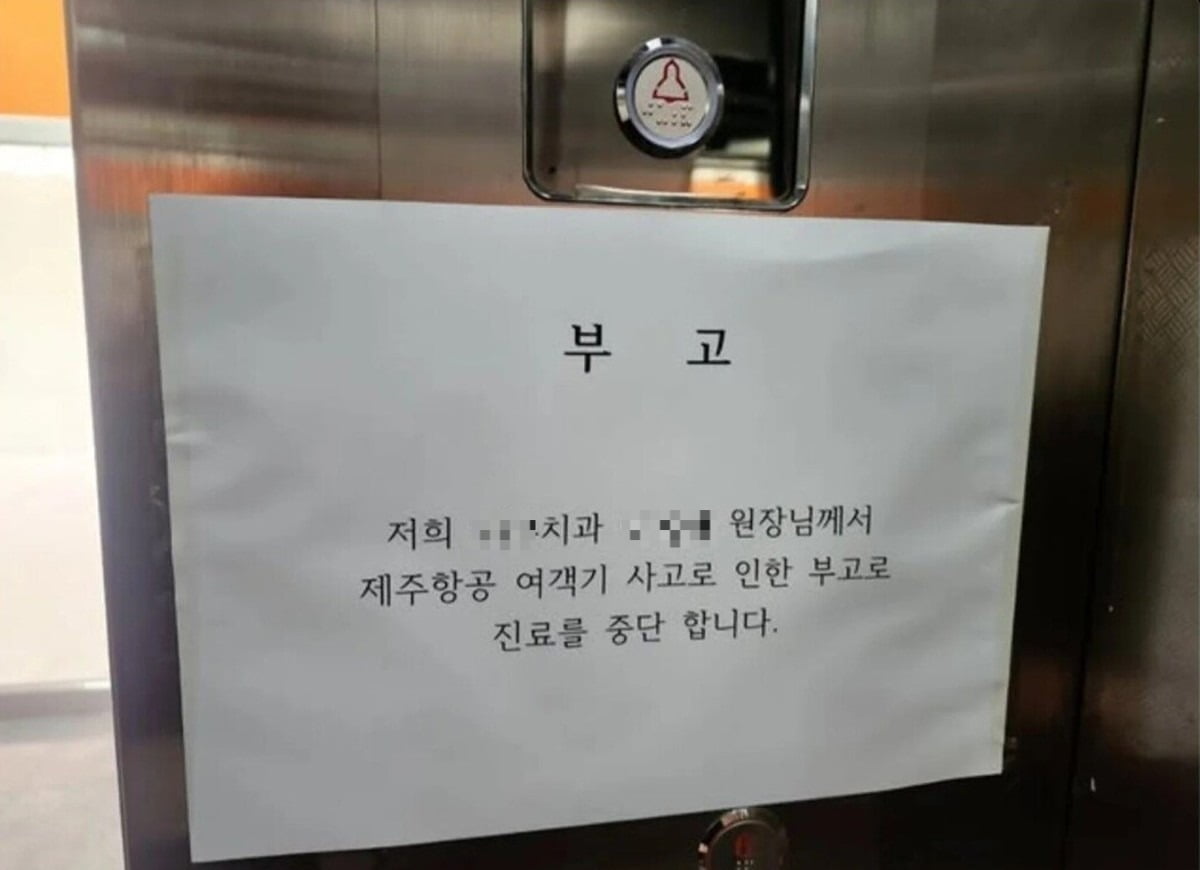그래서 소주는 귀하디귀했다.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그렇다. 중요한 의미를 담아 하사하는 술로 활용됐다. 너무 사치스러우니 금주령을 내려야 한다는 상소도 있었다.
대마도 영주에게 하사했던 물품으로도 등장한다.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약 100년간 꾸준히 품목에 올랐다. 대마도에서 조공을 받고, 답례로 소주를 줬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소주를 받은 대마도는 소주가 발달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소주의 원재료인 곡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90%가 산악지대다. 쌀, 보리 농사가 가능한 땅이 없다.
그렇다면 100년간 하사한 조선의 소주는 어디로 갔을까. 대마도에서 50㎞ 떨어진 이키(岐)섬에서 발견된다. 이키섬은 제주도 10분의 1 크기의 작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선통신사가 일본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들르던 곳이다. 이곳에서 발달한 소주는 보리소주다. 보리를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이다. 술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선 농업이 발달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 사케 소믈리에 교과서(焼酎の基)에서는 이키섬의 소주 기술이 한반도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일본으로 퍼지게 되며, 보리 소주의 근간이 된다.
이키섬엔 흥미로운 소주가 하나 있다. 오모야주조(重家酒造)의 ‘친구(ちんぐ·사진)’라는 제품이다. 발음 그대로 우리말 ‘친구’라는 의미다. 한반도와 워낙 가까우니 우리말 친구가 이키섬의 사투리가 됐고, 이를 소주 이름으로 붙였다. 대마도와 이키섬에는 우리말에서 차용한 단어가 꽤 있다. ‘팟치(ぱっち)’는 ‘바지’를, ‘얀반(やんばん)’은 양반, 즉 사람을 뜻한다.
이키섬의 보리소주는 일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정한 지리적 표시제와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기도 했다. 500년 전 우리가 전해줬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는 어떠한가. 타피오카와 수입 주정으로 만드는 값싼 소주 문화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 농산물로 빚는 전통 방식의 소주는 전체 소주 시장의 1% 미만에 그친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 소주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