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임플란트에 AI 장착…年매출 5000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서비스
美·中 등 해외서 매출 73%
치과서 바로 보철물 제작
3D프린팅 서비스 상용화도
美·中 등 해외서 매출 73%
치과서 바로 보철물 제작
3D프린팅 서비스 상용화도

임플란트업계의 후발주자인 디오가 임플란트 뒤편에 있는 더 큰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31일 기자와 만난 김진백 디오 대표(사진)는 “임플란트와 보철물 제작에 도입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50조원짜리 치과재료 시장, 420조원 규모 치과진료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임플란트 시술자의 10%를 차지하는 무치악 환자는 치과의사가 꼽는 최고 난도 시술 대상이다. 임플란트를 잇몸에 하나씩 심은 뒤 인공치아를 올리는 까다로운 작업을 반복해야 해서다. 임플란트를 심은 뒤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씹는 데만 1년가량 걸린다.
디오는 업계 최초로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임플란트 서비스인 ‘디오나비 풀아치’를 올초 출시했다. 지난 4월엔 미국, 중국 등에서도 서비스를 내놨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의 첫 절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뒤 잇몸을 절개하는 것이다. 절개한 뒤 뼈의 생김새를 확인하고 잇몸을 봉합하는 1차 수술을 한 뒤 2차 수술로 임플란트를 심는다.
이 회사 매출의 73%는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나온다. 한국 치과의사에 비해 손기술이 떨어지는 해외에서 임플란트 시술 간소화 수요가 더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대표는 “임플란트 시술이 간편해지면 틀니를 착용하던 사람을 끌어들이게 돼 결국 치과재료 및 치과진료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며 “내년 초 인공지능(AI)으로 설계 정밀도를 끌어올린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오는 지난 6월 디지털 보철 솔루션인 ‘에코시스템’을 출시하며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보철 시장에 진출했다. 내년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플란트는 잇몸 위에서 인공 치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공 치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만드는 건 기공소 영역이었다. 디오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치과에서 바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1억원이 넘는 보철 제작장비를 구매할 필요 없이 월 10만원대로 프린터를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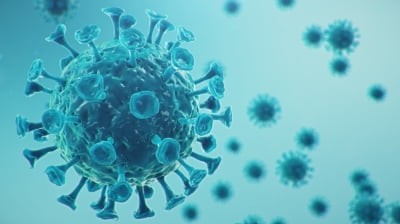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