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이름 '살기 좋은 도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도시' 모습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볼 수 있어
윤성원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볼 수 있어
윤성원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기고]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이름 '살기 좋은 도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7.26904549.1.jpg)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와 새로운 해법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모델이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각종 규제가 스마트시티를 완성해 갈 혁신적 시도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지난 1년4개월 동안 32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셔클을 비롯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신호가 바뀌는 ‘AI교통신호등’,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전력 저장장치(ESS)로 주민끼리 직접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실증사업이 이뤄지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다. 변화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챌린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112와 119가 연계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119 출동 시간을 단축시켰고, 경기 안양에서는 자동음성인식 안심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아동을 신고 19분 만에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시티를 향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미래 도시가 아닌,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도시다. 도시의 똑똑하고 따뜻한 변화는 우리에게 ‘진짜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그간 ‘살기 좋은 도시’의 전통적인 기준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의 질문이다.
올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가 선정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학교, 극장, 레스토랑 등 코로나19로부터 완벽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머지않아 세종,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어디든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이름을 올리리라 믿는다. 그 가능성을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서 찾아보자. 자율주행자동차, 제로에너지 건물 등 첨단 도시 이미지에만 갇혀 있던 스마트시티의 본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누군가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농촌의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37115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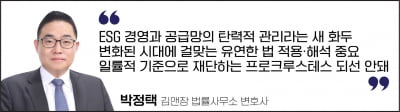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