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빠르게 높이는
햄버거·피자·흰쌀밥 대신
과일·채소·콩·견과류 먹어야

미국 영양학회는 기존의 ‘에너지 균형 모델’은 체중 증가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며, 칼로리보다는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식품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9월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에너지 균형 모델 대신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제안했다. 에너지 균형 모델은 소모되는 칼로리(에너지)가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체중은 감소한다는 모델이다. 반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은 영양분이 지방이 되는 생물학적 기전에 기반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부하지수(GL)다. 혈당부하지수는 식후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나타내는 혈당지수에 탄수화물 양을 곱한 수치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식후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햄버거와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흰 쌀밥처럼 가공된 곡물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감자 등이 혈당부하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다. 반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최소한으로 가공된 곡물, 콩류, 견과류는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연구진은 혈당부하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살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혈당부하지수가 높은 식사를 하면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P)가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내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는 다당체로 저장되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식후 3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하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동화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혈당이 공복 상태보다 낮은 농도까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 반기아(半飢餓)’ 상태로 인식하게 돼 배고픔을 느끼도록 한다. 즉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루트비히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양에만 집중한 체중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배고픔에 시달리며 체중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에너지 균형 모델에 기반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상 칼로리를 발표하고 있다. 19~30세 여성은 하루종일 앉아 있는 경우 소모되는 칼로리는 2000㎉이며, 활동적인 경우 2400㎉ 정도다. 루트비히 교수는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도록 권고하는 공중 보건 메시지는 비만 관련 질병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는 체중 관리와 비만 치료에 새로운 해결법을 제시했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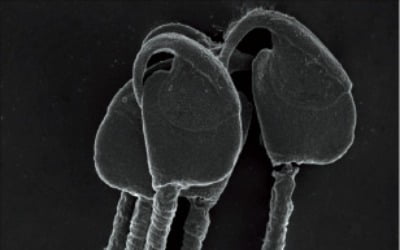



![[단독] "한국이 드디어"…한화오션 등 '1조4000억' 잭팟](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554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