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봉하마을 찾은 이재명, 尹 보란듯 '전두환 비석' 밟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6일 지사직 사퇴…본선 행보
'잠행' 이낙연도 윤석열 비판
'잠행' 이낙연도 윤석열 비판

이 후보는 이날 민족민주열사묘역 입구 바닥에 깔려 있는 전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을 밟고 한동안 멈춰섰다. 그는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두환 찬양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5일 밤 12시까지 경지지사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사임일은 26일 0시다. 그는 “당이 원하는 바도 있고, 신속하게 선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당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선 패배 후 칩거 중이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1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이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윤석열 씨 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런 사람이 국가 최고책임자가 되겠다고 행세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예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광주와 전두환 독재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선 주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압박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
!["노무현의 길 가겠다"는 이재명에 권양숙 "많이 닮았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ZA.2784335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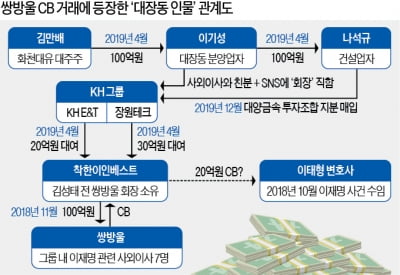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